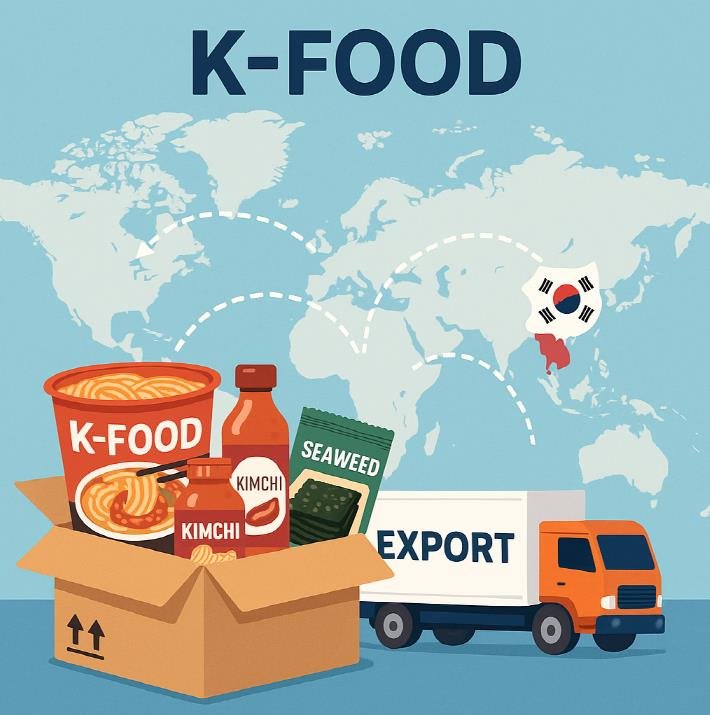이대형 연구원의 우리 술 바로보기(207)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 할 일들
얼마 전부터 ‘K-푸드(K-Food)’로 불리는 한국 식품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도 농식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지금처럼 한국 문화가 더해져 ‘K’를 붙여 ‘K-푸드’라는 이름으로 수출의 중심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24년 기준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라면, 과자류, 음료, 소스류, 쌀 가공식품, 김치 등 14개 품목이 각각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수출 대상국도 2023년 199개국에서 2024년 20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K-푸드라는 이름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해외 현지의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 하고 있다. 한국의 식문화는 무엇보다 ‘한식’으로 대표된다.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한식당 방문 경험 등 관련 지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도 ‘K-푸드’라는 이름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해외 지원 사업뿐 아니라, 외국 내 한식당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식진흥원 등은 한식 확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한식당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뉴욕, 파리, 도쿄에 있는 한식당 16곳은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 우리 전통 주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K-푸드라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제조된 희석식 소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희석식 소주는 K-푸드와 더불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소주 및 과일소주를 포함한 소주류 수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물량은 12만 4,000톤(t)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이를 소주 한 병(360ml)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억 4,000만 병에 해당한다.
하지만 희석식 소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급 주류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대중적인 술로는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술로 해외에 내세우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는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 발족식이 열렸다. 이는 와인이나 위스키 등 외국 술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우리 술의 수출은 여전히 미미한 현실 속에서 주류 무역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국세청이 추진한 것이다.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위스키, 맥주 등 국내에서 수출 가능한 다양한 술들을 한데 모은 것이 이 협의회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전통주 수출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해외 유통망 확보, 인지도 상승, 마케팅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기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먼저 ‘전통주’라는 명칭의 표기 문제다. 과거에는 전통주를 해외에 홍보할 때 주로 ‘korean traditional liquors’나 ‘Traditional Korean alcoholic drinks(외교부 표기)’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막걸리의 경우에도 ‘Korean traditional rice wine’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곤 했다.
지금은 ‘Makgeolli’라는 고유 명칭을 중심으로 하고, 위의 표현들은 설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주’라는 표현은 단순히 전통적인 술이라는 의미일 뿐, 한국 술의 정체성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에서도 각국의 술에 대해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표현은 한국 술만의 고유성을 전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통주 또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술을 외국에 소개할 때, ‘술(Soo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일본은 자국의 술을 ‘사케(Sake)’라는 명칭으로 소개한다. 사케는 일본 술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면서 이제는 사케라 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술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도 ‘술(Sool)’이라는 명칭을 한국에서 생산되는 주류의 해외 공식 명칭으로 통일해 사용한다면, 우리 술의 세계화에 있어 보다 강한 정체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술(Sool) 아래에 각각의 카테고리로 막걸리(Makgeolli), 약주(Yakju), 소주(Soju) 등의 단어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K’라는 접두어의 사용이다. 요즘은 ‘K’가 한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호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 술을 소개할 때 이니셜을 붙이지 않는다. 일본 사케를 ‘J-사케’, 프랑스 와인을 ‘F-와인’,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S-위스키’라고 부르지 않듯이 말이다. 물론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K-소주’, ‘K-맥주’와 같이 한국임을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K-Sool’이라는 명칭보다는 ‘술’이라는 고유 단어를 더 부각시키고, 그 의미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주류’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안의 부처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과거 막걸리의 영어 명칭이 업체마다 달라 혼선을 빚었지만, 정부와 협회의 주도로 ‘Makgeolli’라는 명칭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안에서도 단어에 대한 표준화된 명칭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주들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수출이 확대되었을 때 각 업체의 의견이 분분해져 정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아직 우리 전통주가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기초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통주의 세계화는 더 먼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전통주를 포함한 우리 술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될 것이다.
이대형: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한국술 연구를 하는 연구원
농산물 소비와 한국술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농업 연구사. 전통주 연구로 2015년 과학기술 진흥유공자 대통령 상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전통주의 달인 등을 수상 했다. 개발한 술들이 대통령상(산양삼 막걸리), 우리 술 품평회 대상 (허니와인, 산양삼 약주) 등을 수상했으며 다양한 매체에 한국술 발전을 위한 칼럼을 쓰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로
www.koreasool.net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