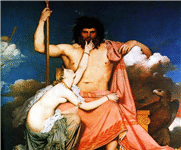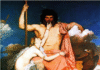南台祐 교수의 특별기고
조선시대 3館에서는 술잔 이름도 제 각각 이었다
예문관↔장미연↔장미배, 성균관↔백송연↔벽송배,
교서관↔홍도연↔홍도배:3관(三館)의 향연과 술잔
조선시대 3관을 ‘예문관(藝文館), 성균관(成均館)과 교서관(校書館)’을 지칭한다. 3관 모두가 정신문화를 장려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예문관’은 조선의 연구기관으로 국왕의 문예에 관한 자문기관이다. 예문관은 문한기구(文翰機構)의 하나로서 사명(詞命: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찬술하는 일을 맡았다. 여기서는 왕족을 봉하는 책문과 신하와 백성에게 내리는 교서, 장상을 임명하는 제고(制誥), 왕의 회답인 비답(批答) 등 왕명과 표(表)·전(箋)같은 외교문서를 왕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직임을 맡고 있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예문춘추관으로 했던 것을, 1401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여 독립관청으로 만들었다.
 ‘성균관’은 고려 말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大學)의 명칭이다. 다른 명칭은 국학(國學), 태학(太學), 반궁(泮宮), 현관(賢關) 등이 있다.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은 풍화(風化)의 근원이요, 인재의 연수(淵藪)였다. 성균관은 문묘를 통해 유교 이념을 강화하였으며, 유생들의 교육을 통해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성균관은 인재를 양성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최고 국립교육기관으로 ‘성(成)’과 ‘균(均)’과 ‘관(館)’이 합쳐진 것이다. ‘성’은 인재를 이룬다는 의미이고, ‘균’은 풍속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관’은 공식적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성균’은 음악의 조율(調律)을 맞춘다는 말로서 즉 어그러짐을 바로 잡아 이루고, 과불급(過不及)을 고르게 한 다는 뜻이다. 즉, 성균관은 바르고 균형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성균관이란 ‘장성균지법전 이치건국지학정’ (掌成均之法典 以治建國之學政)이라는 <주례(周禮)>의 ‘성균(成均)’에서 연원된 것이다.
‘성균관’은 고려 말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大學)의 명칭이다. 다른 명칭은 국학(國學), 태학(太學), 반궁(泮宮), 현관(賢關) 등이 있다.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은 풍화(風化)의 근원이요, 인재의 연수(淵藪)였다. 성균관은 문묘를 통해 유교 이념을 강화하였으며, 유생들의 교육을 통해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성균관은 인재를 양성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최고 국립교육기관으로 ‘성(成)’과 ‘균(均)’과 ‘관(館)’이 합쳐진 것이다. ‘성’은 인재를 이룬다는 의미이고, ‘균’은 풍속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관’은 공식적 기관이라는 의미이다. ‘성균’은 음악의 조율(調律)을 맞춘다는 말로서 즉 어그러짐을 바로 잡아 이루고, 과불급(過不及)을 고르게 한 다는 뜻이다. 즉, 성균관은 바르고 균형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성균관이란 ‘장성균지법전 이치건국지학정’ (掌成均之法典 以治建國之學政)이라는 <주례(周禮)>의 ‘성균(成均)’에서 연원된 것이다.
‘교서관’은 조선시대 삼관(三館)의 하나로, 1392년(태조1)설치된 교서관은 교서감 또는 운각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 정조대에 이르러 규장각의 부속기구로 개편되면서, 규장각은 내각(內閣), 교서관은 외각(外閣)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교서관이 담당하던 업무는 ①서적(경적ㆍ도서)의 인쇄ㆍ출판, ② 목판ㆍ장서(문적ㆍ도서)ㆍ주자(鑄字)의 관리, ③도서의 반사(頒賜)및 판매, ④ 향축(香祝)의 관장, ⑤인전(印篆)의 관장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내세운 유교주의ㆍ숭문주의를 통해 학문적 발달이 왕성하였으며, 서적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전반적인 풍습으로 인해 서적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조선 정부는 서적을 명나라로부터 구입하거나 얻어오는 한편, 인쇄 기관의 설치를 통한 서적 편찬 활동을 통해 내부 수요를 충당하였는데, 교서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설치된 기관이었다.
조선조 초기 왕들은 3관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역성혁명으로 이루어진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신문화 창도에 매진한 면이 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3관에서 행한 향연과 하사한 술잔이 있다. 3관에 해당되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향연명칭이 다르다. 잔치, 음주 그리고 술잔도 각각 그 기관에 따라 특성들이 있다. 임금이 유아(儒雅)를 중히 여긴 까닭에, 궁온을 내려주어 사치하게 하였다. 이렇듯 3관에서 사용한 주배와 음연회 명칭도 각기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각 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과 그 관원이 지녀야 할 품성에 따른 왕의 배려에서 주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관원들 간의 화목과 단결은 물론 다른 관과의 건전한 라이벌의식을 불러일으켜 업무 진작은 물론 국가경영에 일조한다는 의미까지 내제한다.
조선 태종2년(1402) 2월28일에 대언 유기(柳沂)를 보내 궁온(宮醞:임금이 내려주는 술)을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 3관에 주었다. 3관은 각각 상 받은 물건으로서 그 연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문관에서는 ‘장미연(薔薇宴)’이라 하고, 성균관에서는 ‘벽송연(碧松宴)’이라 하고 교서관에서는 ‘홍도연(紅桃宴)’이라 하였다. 3관은 3년에 한 차씩 돌려가며 연회를 마련하여 모여서 술을 마셨다. 임금이 유학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군신의 잔치와 100세를 기념하는 잔치에는 임금께서도 꽃을 꽂는 행동거지가 있습니다.”하니 이덕형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중종 때에 공용경(龔用卿)과 오희맹(吳希孟)이 천사(天使:명나라 황제의 사신)로 나왔는데 중종께서 그들과 함께 후원에서 노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손으로 홍도(紅桃)와 장미(薔薇)두 가지를 어관(御冠)에다 꽂으면서 ‘전하의 양 쪽에 누른빛과 분홍빛이 어른거린다’고 하였습니다.”는 기록이 있다. 예문관이 주최한 연회를 ‘장미연’이라 부른 점은 장미가 그만큼 귀하게 대접받았음을 말한다. 이런 점은 후대인 광해군4년(1612) 9월3일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서 보듯이 임금이 꽃을 꽂을 때에 장미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미는 임금과 관련된 귀한 꽃이었던 것이다.
예문(藝文)·성균(成均)·교서(校書) 3관(三館)이 각각 상 받은 물건으로서 그 연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문관에서는 초여름 장미가 피면 그 아래서 ‘장미연(薔薇宴)’이라 하여 ‘장미배(薔薇杯)’로 회음하였고, 성균관에서는 한여름에는 푸른 소나무 아래서는 ‘벽송연(碧松宴)’이라 하여 ‘벽송배(碧松杯)’로 회음하였고, 교서관에서는 봄이면 살구꽃을 구경하면서 술을 마시는 ‘홍도연(紅桃宴)’이라고 하여 ‘홍도배(紅桃杯)’로 회음하였고, 3년에 한 차례씩 돌려가며 마시며 결속을 다지는 회음(會飮)자리였다.
태종2년(1402)에 왕이 장미를 상으로 내리고 잔치를 베푼 데서 비롯하여, 3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 장미음은 고려시대 역사서 편찬을 담당하던 사관에는 장미 한 그루가 있어 무성한 가지가 마치 차일(遮日)을 친 듯 하였는데, 꽃이 성대하게 피면 그 아래 관원들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꽃구경을 하였던 것을 말한다.
상기에서 3관의 음주 특성을 ‘예문관↔장미연↔장미배’, ‘성균관↔백송연↔벽송배’, ‘교서관↔홍도연↔홍도배’라는 패러다임에서 전개시켰는데, 여기에 마시는 특성을 담아 다음과 같이 더 전개시킬 수 있다. 그것은 ‘예문관↔장미연↔장미음↔장미배’, ‘성균관↔백송연↔벽송음↔벽송배’, ‘교서관↔홍도연↔홍도음↔홍도배’이다. 이렇게 명한 까닭은 예전에는 술잔을‘담(曇)’이라고 불렀다. ‘담’이란 ‘짐새(鴆鳥:맹독을 가진 새)’의 별칭이다. 술잔을 짐조로 비유한 것은 술이 이 짐승보다도 더 독한 까닭에 세심한 가르침을 준 것으로 설명된다. 옛 우리 선조들의 술잔은 대체로 컸다. 이렇게 큰 술잔을 ‘대포(大砲)’라고 부른다. 조선시대 때 성균관에서는 벽송배(碧松杯), 사헌부는 아란배(鵝卵杯), 예문관은 장미배(薔薇杯)라는 큰 술잔으로 돌려 마시는 관습이 있었던데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다.
헤로도토스의<역사(historíai)>에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의 음주습속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그것을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돌림 술을 마시고 그 술자리에서 중요한 사안을 의논하는 습관이 있다 했다. 그렇게 술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된 사안을 이튿날 맑은 정신으로 재확인하고 찬부를 결정했다. 타키투스(Tacitus, 56〜117)의<게르마니아(De Origine et situ Germanorum)>를 보면, 게르만 민족도 혼담을 정하거나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화전(和戰)또는 결정을 협의할 때 술에 얼마만큼 취한 상태에서 의논한다 했다.
우리 조상들의 음주 예절은 두 가지가 있다.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회음(回飮:술잔 돌리기)’이다. 고려 인종 때에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을 지은 바 있고 조선 성종 때에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향음주례’에서도 잔주고 받기가 있었고, 회음의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경주 포석정에는 곡수를 흐르게 하여 술잔을 돌려 마신 신라의 유적이 있어 퇴폐적인 왕실 향락의 방편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나, 이는 임금이 그가 거느린 신하들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결속하는 일종의 정신적 계약 행위로서 복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에서 임금에게 문서를 올리는 날에는 임금께서 주식을 내리게 마련이었는데, 그 술을 고령종(高靈鐘)이라는 큰 술잔에 담아 돌려가며 마셨다 한다. 이러한 관습에 의해 요즈음도 가끔 대포 잔을 돌리며 결속을 다지는 음주 행위가 남아있기도 하다.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사람은 남이 보는 나(당위성)와 내가 보는 나(본심)두개의 나를 가지고 있다. 술자리에서만이 사람들은 남이 보는 나를 탈피하여 격의 없이 흉금을 털어놓고 본심을 속속들이 드러내놓기에, 도리나 체면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하가 격의 없이 한잔 술을 돌려 마심으로써 서로 앙금을 풀고 흉금을 터놓으며 동심일체를 다지는 음례(飮禮)관습이 있었다. 그 대형 돌림 술잔에 각기 이름이 붙어 있었으니, 성균관은 ‘벽송배(碧松杯)’, 사헌부는 ‘아란배(鵝卵杯)’ 교서관은 ‘홍도배(紅桃杯)’, 예문관(藝文館)은 ‘장미배(薔薇杯)’라 했다. 경주 포석정처럼 상하가 술잔을 띄우고 돌려 마시는 유배(流杯)습속도 그것이요, 세조가 즐겨했듯이 싸우러 가는 장수에게 임금이 입을 댄 술잔을 내려 마시게 하는 것도 그것이었다. 돌림 술의 다른 뿌리로서, 우리나라에서 별나게 발달한 제사문화에서 신명(神明)과 접하는 수단으로 제주(祭酒)를 돌려 공음 하는 음복(飮福)절차를 들 수 있다.
 글쓴이 남태우 교수(중앙대학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 ▴2011.07~
글쓴이 남태우 교수(중앙대학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 ▴2011.07~
2013.07 한국도서관협회 회장▴2009.07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2007.06~2009.06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2004.01~2006.12 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