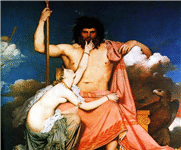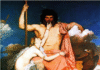우리 민족에게 술은 원래 ‘반주(飯酒)’ 개념이 강했다. 우리 전통주는 가양주(家釀酒)가 그 뿌리다. 이를 바탕으로 한 반주문화는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전통주들은 단맛과 감칠맛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과실 향과 꽃향기 중심의 방향(芳香)으로 술의 품질을 다뤘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술을 어떻게, 언제, 얼마큼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방향주(芳香酒)나 미주(美酒)는 향취를 충분히 즐기고자 하기 때문에 절대 과음을 하지 않게 된다.
반주는 술을 즐기는 외에도 입맛을 돋워주고, 병약한 이에겐 원기(元氣)를 보충해준다. 특히, 노인들에겐 식사에 따른 소화를 도와준다. 반주로 사용하는 전통주는 특유의 단맛 때문에 한두 잔 또는 두서너 잔을 넘지 않는데, 이 1~4잔의 반주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 반주 시 딱 좋은 양이 2~3잔(알코올 양 25g) 정도라는 과학적 근거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실, 술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안주와 같이 마시기’다. 좋은 안주와 함께 하면 술로 인해 해칠 수 있는 건강을 보(保)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 주종(酒類)에 따라 궁합이 잘 맞는 안주는 따로 있다.
탁주와 안주
 쌀과 누룩, 물을 적당히 배합해 발효시킨 술을 술체나 자루를 이용해 짜낸 상태의 흐리고 탁한 술을 탁주라고 한다. 전통주 특유의 향미와 감칠맛, 청량감이 뛰어나다. 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청량미의 상실과 고형물의 앙금이 많아져 주질(酒質)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전통 탁주의 각종 아미노산과 유기산 및 비타민은 발효과정 중에 에스테르(ester), 알데히드(aldehyde), 퓨젤유(fusel oil) 등을 생성해 특이한 향미를 낸다.
쌀과 누룩, 물을 적당히 배합해 발효시킨 술을 술체나 자루를 이용해 짜낸 상태의 흐리고 탁한 술을 탁주라고 한다. 전통주 특유의 향미와 감칠맛, 청량감이 뛰어나다. 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청량미의 상실과 고형물의 앙금이 많아져 주질(酒質)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전통 탁주의 각종 아미노산과 유기산 및 비타민은 발효과정 중에 에스테르(ester), 알데히드(aldehyde), 퓨젤유(fusel oil) 등을 생성해 특이한 향미를 낸다.
탁주에 어울리는 안주로는 김치류를 비롯해 돼지고기, 숙육, 전 등이다. 탁주의 안주로는 무엇보다 수분이 적고 기름기가 많지 않으며 자극성이 없는 음식으로 갖추는 게 좋다. 수분이 많으면 탁주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없다.
청주와 안주
쌀과 누룩, 물을 주재료로 해서 발효시킨 순곡주(純穀酒)로, 고유의 여과기인 용수나 체를 이용해 거른 술을 한지로 다시 한 번 걸러낸 술이다. 일반적으로 ‘탁주에 비해 맑은 술’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청주는 알코올 도수가 13~19% 정도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再)발효나 산패(酸敗)해 맛과 향기가 변한다. 이 때문에 온도가 낮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두고 마셔야 한다.
청주는 감미(甘味)와 산미(酸味)가 적절히 어우러져야 좋은 향기와 맛을 느낄 수 있다. 향기 성분은 이소-아밀알코올(iso-amyl alcohol), 이소-부탄올(iso-butanol),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아세톤(acetone), 디메틸 설파이드 디아세틸(dimethyl sulfied diacetyl) 등이다.
청주류는 전통주 특유의 방향이 있어 풍미(風味)가 좋은데, 이에 곁들이는 안주의 종류에 따라 맛과 향을 느끼는 감흥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청주에는 맛이 담백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한 생선회를 비롯해 조치, 구이 등의 생선요리나 두부, 만두, 버섯류를 이용한 전골이 좋다.
전통소주와 안주
전통소주는 쌀과 누룩, 물을 주원료로 해서 발효, 숙성시킨 양조주의 변질을 예방하고 저장성을 부여하기 위해 증류한 술을 말한다. 흔히 증류식소주, 재래소주 등으로 부른다.
전통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적게 마셔도 빨리 취하지만, 마시고 난 후의 후유증이 덜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가 된다.
전통소주를 마실 때의 안주로는 탁주와 반대로 수분이 많고 기름진 안주가 좋다. 이를 테면 맑은 전골이나 찌개와 같이 뜨거운 음식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기름진 안주가 좋다. 안주 속의 수분이 체내의 알코올을 희석시켜주기 때문에 덜 취하게 하고, 기름진 음식이라야 위장에 해가 덜 하기 때문이다.
가향주(佳香酒)와 안주
가향주는 부재료로 꽃이나 잎, 과실 껍질 등 향이 좋은 가향재(佳香材)와 약성(藥性)을 간직한 초재(草材)를 사용해, 이들 부재료가 함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약효를 얻고자 제조하는 술이다. 매화나 국화, 진달래, 복사꽃, 살구꽃, 창포 등을 이용해 빚은 꽃술(화주?花酒)이 그것이다. 가향주도 청주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여과기인 용수나 체, 주자를 이용해 거른 술을 한지로 다시 한 번 걸러내서 마신다.
가향주의 독특한 향기와 맛을 제대로 즐겨야 하기 때문에 곁들이는 안주와 음식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이 술에 곁들이는 안주와 음식은 아주 담백한 맛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특이한 냄새가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테면 생선회나 백김치, 기름기가 없는 김부각, 쇠고기산적(설야멱) 등이 아주 잘 어울린다.
약용약주(藥用藥酒)와 안주
약주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모든 술을 가리키거나 술의 높임말로 이해하고 있지만, 약주는 약용약주의 줄임말이다. 약이성(藥餌性)을 간직한 초근목피 등 한방 생약재를 부재료로 사용해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향기와 약효를 얻고자 제조하는 술이다. 약용약주도 순곡 청주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여과기인 용수나 체, 주자를 이용해 거른 술을 한지로 다시 한 번 걸러내서 마시는 맑은 술이다.
약용약주 역시 가향주와 같이 향기와 약효에 따른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곁들이는 안주와 음식에는 특이한 냄새가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춧가루나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 생선회나 백김치, 기름기 없는 김부각, 쇠고기산적 등이 좋다.
혼성주(混成酒)와 안주
혼성주는 외래어로 리큐어(liqueur)라고 하고, 약용주로 부르기도 하는 전통주의 하나다. 발효시킨 술을 증류해 소주(위스키, 브랜디, 고량주 등)와 같은 고도주(高度酒)로 만든 후, 향이나 맛, 빛깔이 좋은 약재나 자연재료를 넣어 그 성분과 향기, 빛깔을 추출해내 이를 즐기는 술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조법의 하나다.
매실이나 인삼, 죽순, 오가피, 구기자, 국화, 창포 등을 이용해 담근 술이 이 혼성주에 속한다. 혼성주 역시 일정 기간 숙성을 거친 다음 고유의 여과기인 용수나 체, 주자를 이용, 거른 술을 한지로 다시 한 번 걸러내서 마신다.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고, 숙성을 거칠수록 약효나 향미가 더욱 좋아진다.
혼성주는 그 특징인 독특한 향기와 맛을 즐기고자 하는데 양조의 목적이 있다. 때문에 술의 향이나 맛보다 안주의 냄새가 진하거나 강하면 술맛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기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 소주류의 안주보다 더 담백해야 하고, 향이 덜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고춧가루나 향신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를 테면 편육이나 백김치, 기름기 없는 부각류, 육포, 만두 등이 잘 어울린다.
과실주와 안주
우리나라의 과실주는 포도주, 머루주, 복분자주, 오디주, 사과주, 배술, 매실주 등 몇 개 안 된다. 과실주 중에는 복분자주와 머루주, 오디주가 주류를 이루며, 신맛과 떫은맛, 단맛이 중심을 이룬다. 외국의 와인과 다른 점은, 국내 과실주는 주원료인 과실 자체의 산도(酸度)가 높아 인위적인 보당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맛이 자연스럽지 못한 결점이 있다.
술의 맛과 연관 지어 상호 중화 또는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주의 선택에 있어선 식품 고유의 맛과 향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떫은맛이 강한 술은 그 떫은맛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달고 부드러우면서 새콤한 맛을 주는 조리법이 강구돼야 한다. 음식 궁합이나 맛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궁중겨자채를 비롯해 도토리묵, 전, 곶감 치즈말이 등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