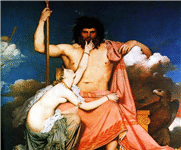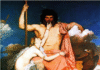전자계산기를 툭 꺼내더니 셈을 해본다. 대략 1만4600병(750㎖ 기준). 지난 세월 마신 막걸리 수다. 매일 한 병씩 40년을 마셨다. 물론 어림잡은 수치(數値)다. 매일 마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하루 한 병만 고집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막걸리업계의 명인(名人)으로 잘 알려진 ㈜성광주조 성기욱(成耆旭?63) 대표 얘기다.
전자계산기를 툭 꺼내더니 셈을 해본다. 대략 1만4600병(750㎖ 기준). 지난 세월 마신 막걸리 수다. 매일 한 병씩 40년을 마셨다. 물론 어림잡은 수치(數値)다. 매일 마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하루 한 병만 고집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막걸리업계의 명인(名人)으로 잘 알려진 ㈜성광주조 성기욱(成耆旭?63) 대표 얘기다.
성 대표는 “막걸리 인생은 실제 군대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지리산 밑 건설공병부대 출신인 그는 각종 식음료 제품을 사다가 부대 PX(매점)에 공급하는 행정서무 일을 담당했는데, 당시 취급물품 중 막걸리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1974년 동국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나 주임교수가 졸업하기도 전에 가서 일해보라며 서울탁주를 소개해줬다. 같은 해 1월 7일 연구개발실에 입사한 그는 76년 주조사 1급 자격증을 땄다. 소주, 맥주, 샴페인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 한 주류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한참을 고민했다. 내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했고, 더 큰 물에서 나를 더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서야 방법을 찾았다. “단돈 몇 푼에 마음 쏠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에 큰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보람을 많이 느껴요. 서울탁주에 있으면서 해놓은 굵직한 업적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시장 판도를 바꾸는 등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성 대표가 말한 대로 그는 정말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 그중 많이 알려진 사실이 ‘막걸리 용기 개발’이다. 아는 사람은 죄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의 막걸리 용기를 처음 디자인하고 보급한 사람이 그다. 그 전까지는 ‘말통’으로 불리는 20ℓ짜리 흰색 막걸리통을 사용했다. 막걸리집에선 파묻은 독에 막걸리를 담아놓고 팔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유통업자나 판매자,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편하도록 막걸리 용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대 ‘사건’이었다.
 “하루는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새벽에 거리로 나섰어요. 당시 우리 막걸리는 새문안교회 쪽과 백병원 뒤쪽, 영등포시장, 청량리 맘모스백화점 쪽에 깔렸는데, 그중 한 곳에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이렇게 양조장에서 바로 나온 술이 맛있다’고 했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새벽에 거리로 나섰어요. 당시 우리 막걸리는 새문안교회 쪽과 백병원 뒤쪽, 영등포시장, 청량리 맘모스백화점 쪽에 깔렸는데, 그중 한 곳에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이렇게 양조장에서 바로 나온 술이 맛있다’고 했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양조장에서 나온 막걸리는 유통과정에서 물과 합쳐지는 일이 잦았다. 술의 양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먹어보지 않아도 맛이 어떨지 짐작 간다.
막걸리 용기 개발에 정신없었던 2년 5개월 동안 별의별 소리도 다 들었다. “미친놈”부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포장할 생각이냐”까지, 심지어 회사 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처음엔 폴리에틸렌 사출(射出)공장에 막걸리 용기를 주문했지만, 얼마 안 가 아예 계열사로 사출공장 하나가 들어섰다. 상황이 역전됐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대히트였다. “지금의 병 색깔인 초록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곤 “그때까지 줄곧 흰색이었는데, 시각(美)적으로도 낫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주질(酒質) 안정도 그가 해낸 업적이다. 당시만 해도 발효 적정 온도나 효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무(全無)했다. 전부터 그랬듯이, 늘 해 온대로 감과 느낌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 표준화 된 맛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사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성 대표 스스로 이론과 경험을 통해 알아낸 ‘효모 증식에 가장 좋은 온도’는 27℃다. 허나, 그때 그 공장에선 37~38℃까지 올라 있었다. 차이가 어마어마했다. 끊임없이 설득했다. 이론만으론 공감하지 않을 게 빤해 체험으로 결과물을 비교하게 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목표치에 도달할 순 없는 법. 약 10℃를 내리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러다 보니 당시 12개 서울탁주 양조장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당장 뛰어가 해결하곤 했다. 그 외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양조장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이끈 것도 그다. 회장을 설득해 1992년엔 자동제국기를 일본서 들여왔다. 도봉공장에 5세트를 들여놓았는데 장소가 협소해 시흥공장으로 옮겼고, 현재 20세트까지 늘렸다. 시루를 없애는 대신 증자기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였고, 역시 20세트까지 들여놨다.
사실 성 대표는 아직까지 ‘성 전무’로 더 알려져 있다. 서울탁주에 몸담은 37년의 세월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올 4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만의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성광주조를 설립했다. 그리곤 100% 쌀막걸리 ‘미담(米?)’을 시장에 내놨다. 곧 ‘사고’를 쳤다. 지난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출품한 미담이 대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를 두고 그는 “신기하게도 운대가 딱딱 들어맞았다”며 웃었다.
“서울탁주 시절 명품주를 만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한 마디로 피곤이 싹 가시는 느낌이랄까요. 무엇보다 자부심도 생겼죠. 그게 가장 큰 상(償)이었습니다.”
미담은 지난 7월 미국에 1200상자(750㎖, 1상자에 20병)를 수출하기도 했다. 이달 9일과 16일엔 일본 수출을 위한 상담 계획이 잡혀있다.
‘성기욱 대표’도 좋고 ‘성기욱 전무’도 좋다. 어쨌든 우리 막걸리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 중 하나다. 우린 ‘성기욱’으로 쓰고 ‘막걸리 명인’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