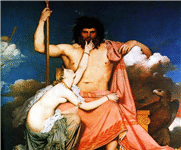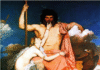허시명의 술여행
경상도 막걸리 여행,
김해주조장과 우포의 아침을 찾아서

부산역 앞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경상도 지역 막걸리 여행을 떠났다. 부산에서 막걸리학교를 하고 싶었을 때, 머리 속에 그렸던 순간이다. 서울에서 진행된 막걸리 당일 여행은 대전이북 정도만을 감당할 수 있었다. 때로 전주까지 내려갔지만, 남쪽 지방은 오가는 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술 맛볼 시간이 줄어들어 감행하기 어려웠다.
경상도는 막걸리가 센 고장이다. 막걸리만이 아니고 성격도 센 고장이다. 강한 억양으로 직설적으로 생각을 내꽂는다. 막걸리 맛이 안 좋으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아니라 직설적 “치와뿌라!”라고 한다. 좋으면 부산 갈매기처럼 모여들면서 열광할 줄 안다. 부산 막걸리학교 1기의 구호는 “부산갈매기! 살아있네!”다.
 양조장 탐방은 섭외할 때마다 어려워움이 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양조장들은 제조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지, 제조 과정을 탐방객들에게 보여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경상남도 양조장 몇 군데를 연락하여 방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다음에 하자거나 곤란하다고 말하는 곳이 많았다. 다행히 전국술품평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김해주조장이 선뜻 우리의 방문을 환영했다.
양조장 탐방은 섭외할 때마다 어려워움이 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양조장들은 제조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지, 제조 과정을 탐방객들에게 보여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경상남도 양조장 몇 군데를 연락하여 방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다음에 하자거나 곤란하다고 말하는 곳이 많았다. 다행히 전국술품평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김해주조장이 선뜻 우리의 방문을 환영했다.
김해시에는 2개의 양조장이 있는데, 상동면 대감리 634번지에 상동양조장이 있고, 어방동 1060-2번지에 김해주조장이 있다. 김해시는 아파트 건설 경기의 붐을 타고 막걸리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부산생탁이 들어오면서, 김해는 막걸리 삼국지가 쓰여지고 있다. 삼국은 부산생탁의 공략 속에 김해주조장과 상동 양조장이 수세적으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김해주조장은 남우준 대표가 동생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터로 자리를 옮긴 것은 3년 전 일이다. 기존 양조장이 주택단지로 들어가면서, 전자부품을 만들던 곳을 인수하여 이전했다, 양조장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건물이 발효공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려웠다. 이층에 사무실과 자동 제국실이 있고, 1층에 수제 제국실, 고두밥찌는 공간, 발효실, 제성실, 병입실이 있었다.
김해주조장은 남우준 대표가 동생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터로 자리를 옮긴 것은 3년 전 일이다. 기존 양조장이 주택단지로 들어가면서, 전자부품을 만들던 곳을 인수하여 이전했다, 양조장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건물이 발효공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려웠다. 이층에 사무실과 자동 제국실이 있고, 1층에 수제 제국실, 고두밥찌는 공간, 발효실, 제성실, 병입실이 있었다.
김해주조장은 토요일 오전인데도 작업이 한창이었다. 지역 양조장이지만 매출량도 상당하여, 안정적인 생산 체계와 인력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자동제국기도 일주일에 한번씩 돌려 쌀 흩임누룩을 만들고, 수작업으로 보쌈하여 밀가루 흩임누룩도 만들어서 술을 빚는다. 술은 흰색병과 초록색병 제품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초록생병에 들어간 막걸리를 더 많이 찾는다고 했다. 재미있는 것은 흰색병과 초록색병에 들어가는 술이 똑같다고 했다.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가 어떻게 제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식탁까지 오르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마시는 술을 이해하는 과정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 음식은 나를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김해주조장의 남씨 형제 두 분은 각기 양조장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함께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생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양조장을 운영했다고 한다. 주촌면(酒村面)이라니, 그렇다면 그곳에 양조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김해시 주촌면의 유래는 살만한 주촌(住村)과 술동네 주촌(酒村)이라는 설이 공존한다.
주촌(酒村)의 지명 유래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지봉(住持峯) 또는 주주봉(酒主峯)아래의 마을, 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번성한 포구였던 선지리의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던 ‘주촌지(酒村池)’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풍수지리설도 한몫한다. ‘옥술잔’형의 명당이 있다는 기록이 여러 풍수지리 문헌에 나온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3년 ‘김해향토문화연구소’와 ‘옥주문화연구회’에서 발굴한 1800년 초기의 옛 ‘김해부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주촌이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이란 뜻의 "住村"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볼 때 주촌이란 지명은 일반적인 의미의 "술(酒)"과는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수백 년 전까지 번성했던 선지포구는 당연히 요즘의 유흥가 즉, 주막거리(酒村)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주촌지(酒村池)로 불렀을 것이다.(주촌지의 현 위치는 선지들판 한가운데에서 동남쪽에서 200~300m 내려간 지점인데 현재도 노인분들은 이 지점을 ‘선창거리’라고 부른다) 그렇게 볼 때 ‘주촌지(酒村池)’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산이기 때문에 주주봉(酒主峰)이 된다. -<주촌면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인용>
 김해주조장에서 우리는 밀가루 흩임누룩을 맛보았다. 밀가루를 사용하여 양조장에서 직접 띄운 것인데, 가루누룩의 신맛이 침샘을 아릿하게 자극했다. 양조장 마당에서 막걸리 한 잔씩을 맛보았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맛과 향기는 공간과 함께 더 잘 기억되기 때문이다. 김해주조장 막걸리는 부산생탁에 견주면 덜 달고 약간 텁텁했다. 부산생탁은 쌀로 빚지만, 김해주조장의 술은 쌀과 밀가루를 섞어서 빚기 때문에 나는 맛이다.
김해주조장에서 우리는 밀가루 흩임누룩을 맛보았다. 밀가루를 사용하여 양조장에서 직접 띄운 것인데, 가루누룩의 신맛이 침샘을 아릿하게 자극했다. 양조장 마당에서 막걸리 한 잔씩을 맛보았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맛과 향기는 공간과 함께 더 잘 기억되기 때문이다. 김해주조장 막걸리는 부산생탁에 견주면 덜 달고 약간 텁텁했다. 부산생탁은 쌀로 빚지만, 김해주조장의 술은 쌀과 밀가루를 섞어서 빚기 때문에 나는 맛이다.
김해주조장을 벗어나 창녕으로 향했다. 창녕읍내 고분군 아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우포의아침’ 양조장을 찾아갔다. 우포의아침은 창녕 대지농공단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홍보관을 갖추고 있어서 그곳에서 회사 내력과 양조 현황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귀여운’ 직원이 퀴즈를 내서 탐방 온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었다. 선물 속에서 양조추출물로 만든 마스크팩과 미용제품이 있었다. 양조장에서 화장품회사와 연계하여, 미용제품까지 팔다니! ‘우포의아침’의 저력이 느껴졌다.
 우포의아침에서 만드는 상품은 다양하다. 창원생막걸리, 북면막걸리, CJ를 통해서 유통하는 우포막걸리, 일본수출용 배막걸리, 복분자막걸리, 양파술, 감술, 건강음료 양파진액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양조현장을 살펴보니, 그 어느 제조장보다도 깔끔했다. HACCP의 기준을 들이대도 결함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제조공정이 분리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물론 우포의아침이 이룩한 성과는 현대식 기계 장비와 자본의 힘이 가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양조장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시설들이었다.
우포의아침에서 만드는 상품은 다양하다. 창원생막걸리, 북면막걸리, CJ를 통해서 유통하는 우포막걸리, 일본수출용 배막걸리, 복분자막걸리, 양파술, 감술, 건강음료 양파진액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양조현장을 살펴보니, 그 어느 제조장보다도 깔끔했다. HACCP의 기준을 들이대도 결함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제조공정이 분리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물론 우포의아침이 이룩한 성과는 현대식 기계 장비와 자본의 힘이 가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양조장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시설들이었다.
우포의 아침에서는 통상적으로 견학로를 통해서 양조 시설을 보여주었다. 열린 양조장, 이를 통해서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우포의아침 같은 양조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포의아침에서는 양파술을 빚기도 하는데, 우포의아침의 소개로 우리나라에 양파를 처음 보급했다는 창녕 성씨 고택을 찾아갔다. 성씨 고택은 다양한 한옥들이 잔치하듯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다. 바닥을 시멘트로 처리하면서 콩돌들을 박아놓아 무료하지 않게 멋을 냈다. 조선의 한옥들이 어떻게 근현대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은, 한반도 지형을 본뜬 연못이 내려다보이는 누마루였다. 그 누마루에서 술 한 잔을 즐겼을 사람들이 눈에 선했다.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우포의아침에서는 양파술을 빚기도 하는데, 우포의아침의 소개로 우리나라에 양파를 처음 보급했다는 창녕 성씨 고택을 찾아갔다. 성씨 고택은 다양한 한옥들이 잔치하듯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다. 바닥을 시멘트로 처리하면서 콩돌들을 박아놓아 무료하지 않게 멋을 냈다. 조선의 한옥들이 어떻게 근현대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은, 한반도 지형을 본뜬 연못이 내려다보이는 누마루였다. 그 누마루에서 술 한 잔을 즐겼을 사람들이 눈에 선했다.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