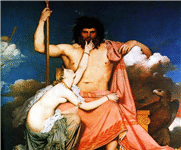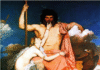溫故知新 박록담의 복원 전통주 스토리텔링(15)
송순주(松荀酒) 스토리텔링 및 술 빚는 법
 ‘송순주(松荀酒)’는 한국의 음주문화로서 반주(飯酒)를 대표하는 전통주이면서 전형적인 가향주(佳香酒, 加香酒) 중 하나다. 우리 전통주 가운데는 ‘두견주’를 비롯하여 ‘도화주’, ‘송화주’, ‘창포주’, ‘연엽주’, ‘국화주’, ‘백화주’ 등 다양한 가향주가 계절성을 띠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 중 ‘송순주’가 집안 어른들의 반주로 가장 널리 사랑받아왔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함양의 일두 정여창 선생의 가문 비주였던 ‘송순주’가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함양 솔송주)된 것을 비롯하여 대전의 은진 송 씨 가문의 ‘대전 송순주’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조선시대 병조좌랑을 지냈던 대장군 집안의 가양주 ‘김제 송순주’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송순이 해를 넘기면 송절이 되는데, 이 송절을 사용한 ‘서울 송절주’가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에서도 ‘송순주’의 대중성 또는 반주로서의 비중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송순주(松荀酒)’는 한국의 음주문화로서 반주(飯酒)를 대표하는 전통주이면서 전형적인 가향주(佳香酒, 加香酒) 중 하나다. 우리 전통주 가운데는 ‘두견주’를 비롯하여 ‘도화주’, ‘송화주’, ‘창포주’, ‘연엽주’, ‘국화주’, ‘백화주’ 등 다양한 가향주가 계절성을 띠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 중 ‘송순주’가 집안 어른들의 반주로 가장 널리 사랑받아왔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함양의 일두 정여창 선생의 가문 비주였던 ‘송순주’가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함양 솔송주)된 것을 비롯하여 대전의 은진 송 씨 가문의 ‘대전 송순주’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조선시대 병조좌랑을 지냈던 대장군 집안의 가양주 ‘김제 송순주’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송순이 해를 넘기면 송절이 되는데, 이 송절을 사용한 ‘서울 송절주’가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에서도 ‘송순주’의 대중성 또는 반주로서의 비중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송순주’는 소나무를 주재로 한 가향주이다. 소나무를 주재로 하는 주품만 보드라도 ‘송엽주’를 비롯하여 송화주·송절주·송령주·송근주·송하주·송지주·송액주가 있는데, 송순주가 향기와 효능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송순주는 크게 두 가지 양주법이 전해오고 있는데, 첫째는 단양법 또는 이양법의 발효주 방식이고, 둘째는 혼양주법이다. 그리고 발효주방식의 송순주는 다시 송순을 삶은 물을 양주용수로 사용하는 단양주법이 있고, 덧술에 삶은 송순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송순 삶은 물을 함께 사용하는 이양주법이 있다.
이번에는 발효주방식의 송순주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혼양주법의 송순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우선 단양주법의 송순주는 <浸酒法>에서 구체적인 주방문을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주방문이 <故事撮要>의 구주법(救酒法)을 비롯하여 <救荒補遺方>, <규중세화>, <醫方合編>, <林園十六志(高麗大本)>,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酒饌>, <治生要覽> 등 9종의 문헌에 9차례나 등장한다. <浸酒法>에 “송순을 많이 꺾어 큰 독에 가득히 담고 물을 가장 덥게 끓여 독에 가득 부었다가 사나흘 지낸 후에 송순을 건져버리고 그 독의 물을 체로 받쳐 재강이를 없이 한 후에 도로 독에 붓고 찰백미 한 말을 익게 쪄서 누룩 한 되 섞어 그 물에 골화 빚어 독두에를 봉하였다가 한 보름 지난 후에 쓰면 그 맛이 가장 맵고, 비록 여러 날을 지내여도 변치 아니하니라.”고 하여 솔순을 우린 물을 양주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효주 방식의 단양주법 송순주가 다른 주품들과는 다르게 여러 문한에서 보듯 공통된 주방문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나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으나 답을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단양주법 송순주 주방문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故事撮要>의 구주법(救酒法)을 비롯하여 <醫方合編>, <浸酒法> 등 어떤 문헌에서도 주원료와 송순 등 배합비율이 정확하게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송순주는 무엇보다 노부모 등 집안 어른의 소화흡수는 물론이고, 혈액순환과 청혈해독작용 등을 목적으로 한 반주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반주로 마실 사람의 주량이나 연령, 건강상태 등 그 대상에 따라 송순의 양과 물 양이 달라지고, 송순의 양과 물 양에 따라 누룩의 양을 달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그때 송순과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특히 송순을 우린 물을 사영하는 주방문이 단양주법이라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추론이 가능해지는데, 송순의 채취시기가 4월 중순 이후 5월 초순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송순의 쓴맛이나 탄닌 함량 정도 등으로 인한 문제이라기보다는 한번 빚는 단양주라는 사실에서, 송순성분의 함량 정도를 끓인 물로 조절하고, 발효상태는 술을 빚는 이의 숙련된 감각에 의존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단양주법 보다 안정된 발효와 높은 주질의 송순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酒食是儀>와 <酒饌>에는 이양주법 주방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밑술을 범벅으로 하여 술을 빚는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酒食是儀>에서는 밀가루를 사용하는 한편으로, 누룩을 계량하는 그릇으로 1주발 1탕기라고 하여 두 가지 용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느 송순주 주방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양주법 송순주는 덧술에 송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酒食是儀>에서는 송순과 끓여 식힌 물을 함께 사용하는 반면, <酒饌>에서는 송순을 삶았던 물을 차게 식혀서 송순과 함께 사용하고, 멥쌀과 찹쌀을 섞어 사용하는 등 술을 빚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酒饌>에서 송순과 송순 삶은 물을 각각 차게 식혀서 사용하고, 멥쌀과 찹쌀을 섞어 사용하는 방법은 유일한 주방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덧술을 찹쌀로만 빚는 경우보다 단맛이 덜하고 깔끔한 술맛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주방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송순주는 혼양주법의 송순주 보다는 그 양주과정도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반가(班家)를 비롯하여 여염집에서 노인들의 반주로 즐겨 빚었는데, 솔잎과 송순을 장복하면 연년수명한다는 연유에서 선호되었던 것 같다. <救荒補遺方>에서 송순을 사용한 방법으로 빚은 술을 적선주(謫仙酒)로 표기하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송순주(松荀酒)<故事撮要>·<救荒補遺方>·<규중세화>·<醫方合編>·<林園十六志(高麗大本)>·<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酒饌>·<治生要覽>·<浸酒法>
 ◇ 술빚는법 ① 송순이 막 자랄 때(필 때) 많이(5되~1말) 따다 (모엽을) 다듬고, 깨끗하게 씻어 술독에 가득 채워 놓는다. ② 물을 매우 끓여 술독에 가득 채워 3~4일간을 지내서 우려낸 다음, 맑아지기를 기다려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③ 찹쌀 1말을 (백세하여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를 빼 놓는다). ④ 불린 찹쌀을 시루에 안쳐서 고두밥을 짓고, 익었으면, 퍼내고 (고루 펼쳐서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⑤ 송순 우린 물에 고두밥과 누룩가루 1되를 한데 합하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⑥ 술밑을 술독에 담아 안친 후, 예의 방법대로 하여 단단히 밀봉한 후, 15일간 발효시킨다.
◇ 술빚는법 ① 송순이 막 자랄 때(필 때) 많이(5되~1말) 따다 (모엽을) 다듬고, 깨끗하게 씻어 술독에 가득 채워 놓는다. ② 물을 매우 끓여 술독에 가득 채워 3~4일간을 지내서 우려낸 다음, 맑아지기를 기다려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③ 찹쌀 1말을 (백세하여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를 빼 놓는다). ④ 불린 찹쌀을 시루에 안쳐서 고두밥을 짓고, 익었으면, 퍼내고 (고루 펼쳐서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⑤ 송순 우린 물에 고두밥과 누룩가루 1되를 한데 합하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⑥ 술밑을 술독에 담아 안친 후, 예의 방법대로 하여 단단히 밀봉한 후, 15일간 발효시킨다.
*주방문에 ‘松荀酒(송순주)’가 아닌, ‘송순(松荀)’이라고만 되어있다. 송순과 물의 양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찹쌀의 양을 기준으로 그 양을 산정하였다. 또 “15일이 지나면 먹는데, 그 맛이 매우 진하고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송순주 방문 원문> 송순을 만이 껀거다가 큰 독에 다단케 담고 물을 만이 끓여 그 독에 가득히 부어 한 이틀 지내거든, 건져버리고 그 물 체에 밧타 그 독에 도록 역코(넣고), 점미 한말을 익이 쪄 누룩 한 되 교합하여 그 독에 역코(넣고), 봉해 두면 보람 지내거든 내어 쓰면 맛이 가장 좋고 과하 하여도 변치 아예 하나니라.
◈ 松荀酒 <酒饌>
◇밑술 ① 찹쌀 2되를 백세하여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를 뺀 후) 작말하여 넓은 그릇에 담아 놓는다. ② 물 6되를 팔팔 끓여 쌀가루에 골고루 합하고, 주걱으로 고루 개어 죽(범벅)을 쑨 다음, 넓은 그릇에 퍼서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③ 죽(범벅)에 가루누룩 2되를 합하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④ 술독에 술밑을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7일간 발효시킨다.
◇덧술 ① 송순 1~2되를 물에 깨끗하게 씻어 건졌다가, 물 6되에 삶아 건져서 모엽(母葉)을 제거한 후, 송순과 송순 삶은 물을 각각 차게 식힌다. ② 찹쌀 2말을 백세하여 (물에 담가 오랫동안 불렸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를 뺀 후) 시루에 안쳐서 고두밥을 짓는다. ③ 고두밥을 찔 때, 찬물을 두 차례 살수하여 무른 고두밥을 짓고, 익었으면 퍼내고 그릇에 담아 놓는다(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④ 고두밥에 시루밑물을 붓고 살살 비벼 헹궈서, 밥알이 손에 달라붙지 않게 한다. ⑤ 시루밑물에 씻어 헹군 고두밥과 송순 삶은 물, 밑술을 한데 합하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⑥ 술독에 술밑을 담아 안치되, 송순을 켜켜이 넣고 단단히 봉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차고 시원한 곳에 두고 발효시킨다.
◈ 별별 약쥬(송순주)법이라 <酒食是儀>
 ◇ 밑술 : 멥쌀 2말 5되, 누룩 1주발 1탕기, 밀가루 1되, 끓는 물 25식기. : 덧술 : 멥쌀 · 찹쌀 각 30식기, 끓여 식힌 물 62식기, 송순 2되
◇ 밑술 : 멥쌀 2말 5되, 누룩 1주발 1탕기, 밀가루 1되, 끓는 물 25식기. : 덧술 : 멥쌀 · 찹쌀 각 30식기, 끓여 식힌 물 62식기, 송순 2되
◇ 밑술 ① 3월 하순경에 도정을 많이 한 멥쌀 2말 5되를 (백세한 후,)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를 뺀 후,) 곱게 빻아 가는 체로 쳐서 넓은 그릇에 담는다. ② 솥에 맛 좋은 물 25식기를 고붓지게(솟쿠치게) 끓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하여 쌀가루에 붓고 주걱으로 골고루 개어, 멍울 없는 범벅을 짓는다. ③ 범벅을 온기 없이 차게 식힌 다음, 좋은 누룩 1주발 1탕기와 밀가루 1되를 섞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④ 군내 나지 않는 술독을 짚불연기 쏘여 소독한 후에 술밑을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는 곳에 두어 20일간 발효시킨다.
◇ 덧술 ① 산에 가서 쥐꼬리만 하게 자란 송순을 꺾어다 수염을 다듬고,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시루에 안쳐서 한 김 올려 쪄서 차게 식혀 놓는다. ② 좋은 물 62식기를 팔팔 끓여 밤재워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③ 고두밥은 좋은 물을 안친 솥에 올려 찌되, 멥쌀 30식기와 찹쌀 30식기를 희게 쓸어(도정을 많이 하여 백세한 후,) 물에 담갔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를 뺀 후,) 각각 시루에 안쳐서 고두밥을 짓는다. ④ 멥쌀고두밥에는 물을 많이 뿌려서 질게 찌고, 고두밥이 익었으면 각각 퍼내어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⑤ 멥쌀고두밥과 찹쌀고두밥에 차게 식혀 둔 물을 등분하여 한데 섞는다. ⑥ 각각의 고두밥에 밑술과 송순을 한데 합하고, 골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⑦ 군내 나지 않는 술독을 짚불연기 쏘여 소독한 후에 술밑을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김이 새지 않게 밀봉한다. 8. 술독은 덥지도 차지도 않는 곳에서 발효시켜, 푹 가라앉으면 용수 박아 채주한다.
*주방문 말미에 “송순을 약간 넣으면 송순주요.”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송순주(松荀酒)’ 주방문을 작성하였다. <별별 약쥬(송순주)법이라> 멥쌀 슈물다셧 되를 희게 씰러 담가다가 곱게 아 가는 채로 쳐서 물 맛 조흔 것으로 고부지계 려 슈물다셧 식기을 듭도 도 안케 여 망올 업시 반쥭 후 온긔 읍시 식이여 누룩 쥬발 탕긔 진말 식기 넉고 고로 버물리여 군 읍은 항아리 집 쏘이여 항아리의 너허 덥도 도 안이 두엇 이십 일 만의 멥살 셔른 식긔 찹살 셔른 식긔 희계 씰러 되 각각 죠흔 물의 계 고 메밥은 물 만이 려 질계 셔 더운 긔운 읍시 식인 후 죠흔 물 고부지계 려 로밤 운 후의 예슌두 식긔을 여흐되 찹살밥과 멥살밥 밋쳘 여 고로 셕거 버무려 알마진 항아리의 군 읍시 집 쏘이여 넉코 짐 안니 나계 부리을 봉여 덥도 도 안이 두고 슐이 다 되면 푹 가라안나이 용슈 너어 먹니 밋쳘 오 둘록 조흐이라. 봄이면 피기 젼의 밋 여가 덧틀 졔 두견화 약간 셕거 면 두견쥬요, 여름의 소쥬 식기 더면 과하주요, 송슌을 약간 너흐면 송슌쥬요, 이 슐은 날물이 안이 든 슐인 고로 치담고 두통이 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