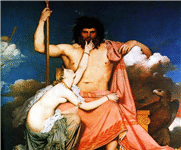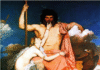김원하의 취중진담
풋술 마시던 시절이 그립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한영애가 1988년 불렀던 ‘누구 없소’를 신인 가수 이무진이 JTBC 싱어게인 결승전에서 불러 유행시킨 노래다.
새파랗게 젊은 가수가 부른 ⁓누구 없소⁓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 가슴속 허한 마음을 채워줄 친구가 그리워서인가 보다. “거기 어디 술꾼 없소”처럼 들린다. 푸르던 젊은 날에는 옷깃만 스쳐도 술 한 잔 할 수 있는 친구가 넘쳐나고, 별이라도 따오겠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두주불사 하던 술친구들이 가을 낙엽 떨어지듯 하나 둘 떠난다.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난 친구며, 의사의 강력한 금주령에 술잔만 바라보는 친구들 수가 늘어난다.
‘누구 없소’를 유행시킨 이무진은 기타부터 보컬까지 기교란 기교는 다 부려 귀엽고 풋풋해 보이는 가수다. 숱한 가수들이 샛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연예계여서 아무리 눈여겨봐도 누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를 판에 필자의 뇌리에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란 가사가 꽂힌 것은 나에게는 의외의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이무진 이때는 완전 갓 캐낸 감자인데 지금은 깔끔하게 포장된 백화점 식품관 감자’라고 평한다. 이 말에 필자도 동의 한다.

감히 이루어 질수 없는 꿈이겠지만 풋술을 마시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술 맛도 모르면서 어른들이 술을 따라주면 넙죽넙죽 마셨다. 많이 마시는 것이 술 잘 마시는 것으로 생각 하던 시절이지만 그 때가 그립다. 마치 요즘 유튜브 방송에서 신동엽이 진행하고 있는 <짠한형>에 출연하고 있는 게스트(신동엽은 물론)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며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필자의 젊은 날을 돌아보게 한다.
당시 소주의 도수는 60년 대 30도에서 70년 대들어서면서 25도로 내렸다. 지금처럼 2홉(360㎖)짜리가 아닌 640㎖짜리 삼학(三鶴)이나 무학(舞鶴), 보배, 금복주 같은 소주가 주를 이루었는데 잘난 체 한다고 병나발을 불고 다녔다.
이제 세월이 늙어 받아 마시던 입장에서 술을 따라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요즘 MZ세대는 고사하고 중장년층들도 혼 술을 선호해서 그런지 이른바 꼰대들하고는 술을 마시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술친구들이 그립다.
-거기 누구 없소-란 말을 패러디해서 -거기 술꾼 없소-처럼 들린다.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 말 한 마디가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나이 듦에 서서히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찾는 절규인지도 모른다.
풋내기 시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술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삶이다.
가을 햇볕이 참으로 좋다. 서정주의 국화 옆이 아니더라도 좋다. 눈부시게 내리쬐는 가을 햇볕에서 서양미술사를 가르치는 우정아 포스텍 교수는 어느 칼럼에서 ‘햇빛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했다. -맑고 쨍한 가을 햇볕에 옥양목 이불을 널어 말리면 며칠 동안 잠자리에서 햇빛 냄새가 났다 –
요즘 사람들은 옥양목 이불이 어떤 이불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햇볕 좋은날 널어 말린 옥양목 이불에서 느끼는 감촉은 냄새도 좋지만 따스하다. 햇볕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가을 햇볕을 쬐면서 먼저 떠난 친구들 얼굴이 떠오른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조용필도 떠나보낸 그리운 친구가 있었나 보다.
풋내기 기자 시절 어디를 가나 막내 기자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른 행세를 한답시고 斗酒不辭, 酒種不辭로 술을 마셨다. 참으로 미련한 짓이었다. 그런데도 요즘 가끔 풋술을 마시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나에게도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것일까.
<삶과술 발행인> t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