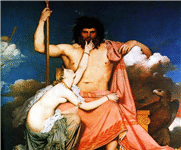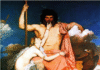溫故知新 박록담의 복원 전통주 스토리텔링(17)
창포주(菖蒲酒) 스토리텔링 및 술 빚는 법
 매년 단옷날이면 서울의 남산골한옥마을을 비롯하여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세시(歲時)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창포(菖蒲)다. 창포 목욕과 머리감기, 비녀꽂이 등 세시풍속(歲時風俗)이 재연되어 세인들의 흥미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단옷날이면 서울의 남산골한옥마을을 비롯하여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세시(歲時)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창포(菖蒲)다. 창포 목욕과 머리감기, 비녀꽂이 등 세시풍속(歲時風俗)이 재연되어 세인들의 흥미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포는 국화 못지않게 다시금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친숙한 식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행사 때 머리감기며 비녀꽂이 등에 사용하고 있는 창포를 보면 실망하게 된다. 대개가 꽃창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포(菖蒲)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에는 창포와 꽃창포가 있고, 이것들이 같은 종류로 알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꽃창포는 붓꽃과인 반면, 창포는 천남성과로서 다른 종류의 식물이다.
꽃창포를 창포로 알고 있는 이유 가운데는 우선, 꽃창포는 그 잎이 창포와 같이 생겼고 꽃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들 두 가지 식물이 다 물을 좋아하고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점에서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포는 꽃창포와는 꽃의 형태가 전혀 다르다. 창포는 같은 꽃대에 아주 작은 꽃들이 수 없이 달라붙어 있는 육수화서라고 하여 특이한 꽃차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꽃자루가 조 이삭처럼 생긴 데다 곧추 서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언제 꽃이 피어있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것이다. 또한 꽃자루가 조 이삭처럼 생긴 데다 곧추 서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언제 꽃이 피어있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창포(菖蒲)는 석창포(石菖蒲)라고 하는 천남성과의 다년초로서, 전국의 연못이나 호숫가에 자생하는데, 이 창포의 향기가 뛰어나 악병(惡病)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창포는 창포(菖蒲)와 석창포(石菖蒲)로 크게 나뉘는데, 석창포가 창포보다 약효가 우수하여 쓰임새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창포의 약리작용을 보면, 주성분으로 정유성분(아세톤)과 배당체를 함유, 그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 맛이 있으며,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고 한다.
창포는 창포(菖蒲)와 석창포(石菖蒲)로 크게 나뉘는데, 석창포가 창포보다 약효가 우수하여 쓰임새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창포의 약리작용을 보면, 주성분으로 정유성분(아세톤)과 배당체를 함유, 그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 맛이 있으며,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이 창포를 이용한 ‘창포주(菖蒲酒)’는 중풍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크며, 한방과 민간에서는 담습을 없애고 입맛을 돋우며 독을 풀어준다고 하여, 특히 선비들 사이에서 ‘창포주’를 즐겼는데, 창포의 잎과 뿌리에는 특별한 향취가 있기 때문이었다.  창포 잎을 손바닥에 놓고 부비면 샴푸처럼 독특한 향기가 난다. 뿐만 아니라 항균작용을 하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술과 함께 마시면 건강에도 좋았던 것이다.
창포 잎을 손바닥에 놓고 부비면 샴푸처럼 독특한 향기가 난다. 뿐만 아니라 항균작용을 하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술과 함께 마시면 건강에도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옛날 여인들은 창포를 달인 물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면 피부와 머리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귀먹은데, 목쉰데, 배 아픈데, 이질, 풍한, 습비에도 효능을 발휘하며, 창포주를 5홉들이 잔으로 한 잔씩 하루에 세 번 마시면 기운이 화(和)하고 무병하여진다고 하며, 중풍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창포주’는<攷事新書>를 비롯하여<攷事十二集>,<東醫寶鑑>, <農政會要>, <達生秘書>, <양주방>, <林園十六志>, <酒饌>, <鶴陰雜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攷事新書>를 비롯하여 <攷事十二集>, <農政會要>, <양주방>, <鶴陰雜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창포주’ 빚는 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술 빚는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치는 단양주법(單釀酒法)으로, 창포를 짓찧어 만든 창포 즙에 고두밥과 누룩을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양주방>에는 두 가지 별법(別法)이 등장하는데, 청주(淸酒)에 창포뿌리를 담가서 우려 마시는 ‘침지법(浸漬法)’, 그리고 ‘침지법’으로 빚은 술에 다시 고두밥을 지어 넣고 발효시키는 방법의 특이한 주방문도 엿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酒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술에 창포 잎을 띄워 마시는 방법들을 볼 수 있는데, 고려 말기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시인과 선비들의 시집과 문집에 ‘창포주’에 대한 시편들이 무수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창포주’는 이미 빚어 둔 ‘부의주’나 ‘동동주’, 기타 ‘청주’에 때맞추어 창포뿌리나 창포 잎을 넣어 재차 숙성시키거나, 현장에서 그 향기와 약성을 침출하여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포주’는 ‘초백주’, ‘국화주’와 더불어 고려시대 때부터 선비들 사이에서 즐겼던 대표적인 절기주의 한 가지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주풍속은 계절변화에 맞추어 즐기는 세시주(歲時酒)로서 ‘창포주(菖蒲酒)’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말해준다고 하겠으며, 봄철의 대표적인 풍류로서 ‘창포주음(菖蒲酒飮)’이라는 독특한 음주풍속을 낳게 된다.
매년 사대부와 시인묵객들이 단오명절을 즐기고자 모인 현장은 대개 ‘유상곡수(流觴曲水)’나 ‘탁족(濯足)놀이’를 하기에 적합한 물가에 위치하기 마련인데, 이때 품속의 장도(長刀)를 사용하여 창포 잎을 뜯어다 머리칼같이 가늘게 썰어서 가져 온 술동이나 술잔에 띄워서 주향(酒香)에 창포향(菖蒲香)을 첨가하여 즐기는 음주풍속이다.
이는 옛 사람들의 아름다운 풍류와 함께 더워지는 여름철을 대비하는 지혜와 방향(芳香)으로서, 잡귀를 쫓고자 했던 벽사풍속(辟邪風俗)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창포주’는 이미 빚어 둔 ‘부의주’나 기타 청주에 때맞추어 창포뿌리를 넣어 재차 숙성시키거나, 그 향기와 약성을 침출하여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이 있다. <山林經濟>를 비롯한 여러 주방문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다수 나타나고 있지만 그 현장성과 즉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인들의 작품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면, 조선 전기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의 문집인 <양곡선생집(陽谷先生集)>에 수록된 “단오(端午)”라는 시에서,
오늘이 바로 단오이니 소년들이 무리지어 즐겁게 노네(今日是端午 戱遊群少年).
거리마다 다투어 씨름을 하고 나무마다 그네를 뛰네(街袈爭角觝 樹樹颺秋天).
잔에 창포를 띄워 따뜻하고 문에는 애호를 엮어 달았네(酒泛蒲觴暖 門編艾虎懸).
노인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밤새도록 책덮고 잠자는 것이네(老翁何所事 終夕掩書眠).
라거나,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서파집(西坡集)> 중 “대전 단오첩(大殿端午帖)”이란 시에,
창포를 오래 묵은 술에 띄울제(蒲泛千年酒), 석류는 5월에 꽃 피우네(榴開五月花).
금화전에선 부지런히 한낮에 강의하니(金華勤日講), 시대의 운수가 형통하게 되었네(時運屬亨嘉).
라고 읊은 것으로 미루어, 창포를 띄운 술을 ‘창포주’로 총칭하는, ‘창포주음(菖蒲酒飮)’의 현장과 즉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창포주’를 노래한 시를 보아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시인묵객(詩人墨客)들 사이에서 ‘창포주’가 널리 애음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도 사림과 풍류객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는 등 ‘창포주’가 단오절의 절기주로 뿌리를 내려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필자도 ‘창포주음’을 주제로 한 시주풍류(詩酒風流)를 시도한 바 있다
이랑마다 푸른 물결 새소리는 푸른 가락(歌樂), 사람마다 머리 감고 난탕(蘭湯)에 목욕하니
좋은 날 봄빛을 얻어 여기(沴氣) 씻는 명절(名節)이라네.
술잔에 뜬 창포 잎은 푸른 바람을 불러와 향기롭고, 동이 술 잔질하며 사람마다 흥겨우니
잊혀진 시속(時俗)을 좇아 풍류(風流)를 사양하지 않네. -졸작 “단오풍경(端午風景)” 전문
이렇듯 ‘창포주’는 단오 무렵에 창포를 넣어 술을 빚기도 하지만, 물가에 나아가 야음을 하면서 물가의 창포를 뜯어 술에 띄워 마시면서 창포향기는 물론 단양(端陽)의 좋은 절기를 시(詩)와 함께 감상하고자 했던 사대부와 선비, 시인묵객들의 시주풍류(詩酒風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다른 명절이나 절기에 비해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들이가 분주해지는 연말연시와 단오, 그리고 중양절에 세시주(歲時酒) 감상이 많았고, 수많은 문사들 사이에서 ‘초백주’나 ‘국화주’처럼 현장성과 즉흥성을 수반하는 음주풍속과 그 감회를 시로 읊은 까닭이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菖蒲酒 <農政會要>
◈ 菖蒲酒 <農政會要>
◇술재료 : 구절창포즙 5말, 찹쌀 5말, 누룩 5근
◇술 빚는 법 : ① 창포(菖蒲)를 캐되, 뿌리 1치 길이에 아홉 마디가 있는 구절창포(九折菖蒲) 뿌리를 많이 캐어 물에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과 잔뿌리를 제거한다. ② 다듬은 석창포 뿌리를 절구에 찧고 짜서 얻은 창포즙 5말을 만들어 준비한다. ③ 찹쌀(糯米) 5말을 (백세하여 물에 담가 불렸다가, 건져서) 시루에 안쳐서 고두밥을 짓는다. ④고두밥이 익었으면 퍼내고, 고루 펼쳐서 차게 식기를 기다린 다음, 넓은 그릇에 퍼 담는다. ⑤ 누룩을 곱게 빻아 체에 쳐서 내린 누룩가루 5근과 창포즙, 고두밥을 한데 합하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⑥ 테가 있는 자기항에 술밑을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끈으로 묶어 밀봉하고 이불로 덮어 발효시키고, 익기를 기다려 채주하여 마신다.
<菖蒲酒> 取九節菖蒲生搗絞汁五斗糯米五斗炊飯細麯五斤相拌勻入缸醰蜜蓋二十一日卽蓋溫服日三服之通血脉滋榮腎治風痹骨立黃醫不終始服一劑百日後顔色光彩0力倍嘗耳目聰明髮白變黑落更生袍有光明延年益壽功不盡逑.
◇ 주방문 말미에 “하루 세 차례씩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사람의 혈맥이 다 통하게 되고 영위가 좋게 되니 이 술을 여러 해 마시면 뼛속 깊이 박힌 병이 다 낫고, 신색이 윤택해지고 기력이 갑절이나 나아지고, 걸음걸이가 나는 듯해지고, 흰머리가 도로 검어지고, 빠졌던 이가 다시 나고, 있는 방안에 빛이 나고 점점 밝아진다. 늙도록 먹으면 신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자심밀개(磁鐔密盖)’라고 하였는데, 이를 ‘테가 있는 자기항에 술밑을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끈으로 묶어 밀봉하고 이불로 덮어’로 해석하였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본 ‘창포주(菖蒲酒)’ 주방문은 다른 기록에서는 목격되지 않는 독특한 방법으로 발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攷事新書> 5월 5일에 한 치에 아홉 마디가 있는 석창포(石菖蒲)의 뿌리를 캐어 찧어서 즙을 만든다. 찹쌀(糯米)과 고운 누룩가루(細麴)를 집어넣고 술을 빚어 마시면 신(神)과 통하고 수명이 연장된다.
◇ <양주방> 들에 돋은 창포 뿌리를 캐어 죄다 씻어 짓찧어 즙을 내어 닷 말만 하고 찹쌀 닷 말을 깨끗이 씻고 또 씻어 익게 지에밥을 쪄라. 좋은 누룩가루 닷 되를 창포 즙에 섞어 백항아리에 넣어 단단히 봉하여 두어라. 세 이레 뒤에 내어 오홉들이 잔으로 하루 세 번씩 먹어라. 기운이 화하고 무병하여진다.
◇<양주방> 또 한방문은 창포 뿌리를 엷게 조각내어 썰어 서근을 볕에 꽤 말리어 비단 주머니에 넣어 맑은 술 한말에 담가 백일 만에 보아 파랗게 되었거든 찰기장쌀 한말을 익게 쪄서 넣고 단단히 봉하여 두어라. 두 이레 만에 내어 먹으면 온갖 병이 다 없어진다.
<양주방> 또 다른 방문은 창포 뿌리를 송송 썰어 한말만 비단 주머니에 넣어 맑은 술 닷 말에 담가 백항아리에 넣어 봉하여 두어라. 가을이나 겨울엔 두 이레 만에 봄이나 여름엔 한 이레 만에 떠서 하루 세 차례씩 너홉들이 잔으로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늙지 않고 튼튼하여지며 정신이 좋아진다. 이 술 세 법을 다 해 먹으면 사람의 혈맥이 다 통하게 되고 영위가 좋게 되니 이 술을 여러 해 먹으면 뼛속 깊이 박힌 병이 다 낫고, 신색이 윤택해지고 기력이 갑절이나 나아지고, 걸음걸이가 나는 듯해지고, 흰 머리가 도로 검어지고 빠졌던 이가 다시 나고, 있는 방안에 빛이 나고 점점 밝아진다. 늙도록 먹으면 신선을 만날 수 있다.
<林園十六志> 풍으로 마비된 것을 풀어 주며 혈액순환을 돕고 뼈가 저린 것이 치료되며 눈과 귀를 맑게 한다. <本草綱目>을 인용하였다.
 ◈ 菖蒲酒 <酒饌>
◈ 菖蒲酒 <酒饌>
◇술재료 : 청주 1말, 창포뿌리, 명주자루, 청량차조 1말
◇술 빚는 법 : ① 창포뿌리를 물에 깨끗이 씻어 흙과 잔털 등 잡물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놓는다. ② 창포 썰어 놓은 것을 햇볕에 바짝 말린다. ③ 술독에 청주 1말을 붓는다. ④ 창포뿌리를 명주자루에 담고 끈으로 묶어 술독에 넣는다. ⑤ 술독은 단단히 봉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3개월간 보관한다. ⑥ 3개월 후 술독을 열면 술 빛깔이 푸르게 변하였으면, 고두밥을 준비한다. ⑦ 생동찰(청량차조)을 백세 하여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다시 씻어 헹궈서 물기를 뺀 후,) 시루에 안쳐서 고두밥을 짓는다. ⑧ 고두밥이 무르게 푹 쪄졌으면 퍼내고, 고루 펼쳐서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⑨ 생동찰고두밥을 술독에 넣고 고루 저어준 뒤, 밀봉하여 7일간 발효시킨다.
<菖蒲酒> 菖蒲根細切陰陽乾之以紬袋裹而浸之於淸酒一斗中堅封三朔後視之色靑則粘靑粱米一斗熟烝添入又堅封七日後用之則三十六病自消而又療風症. * 주방문 말미에 “이 술을 마시면 36가지 병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고, “중풍도 치료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