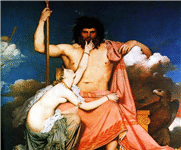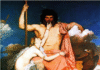술자리 꼴 볼견과 술의 경제학
 현대인들에게 있어 술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묘약(妙藥) 가운데 첫째로 꼽힌다. 퇴근길에 술집에 들러 친구나 동료들과 한 잔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누가 쏘든 인심 쓰듯이 술잔을 돌리고, 나아가 ‘위하여’를 외치며 분위기를 돋우는 우리의 음주문화는 원샷으로 절정에 이른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술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묘약(妙藥) 가운데 첫째로 꼽힌다. 퇴근길에 술집에 들러 친구나 동료들과 한 잔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누가 쏘든 인심 쓰듯이 술잔을 돌리고, 나아가 ‘위하여’를 외치며 분위기를 돋우는 우리의 음주문화는 원샷으로 절정에 이른다.
우리는 서구의 독작(獨酌)문화와 달리 대작음주(對酌飮酒)문화가 특징이다. 서구의 독작음주는 아예 혼자 마신다든지 여럿이 마셔도 자신이 마시고 싶은 만큼 술잔에 따라 마시는 식이지만, 대작문화는 권커니 잣거니 하는 수작(酬酌)의 음주문화다. 대작음주문화의 특징은,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부여한다”고 한다.
술집에서 집단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재미있다. 처음 한 순배야 화기애애한 분위기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술 몇 잔에 주정을 부리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고성방가를 일삼는 사람, 상대방의 못마땅한 점을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 말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 큰소리치는 사람 등 별별 형태로 발전한다. 직장인들의 술자리에서는 상사나 동료를 안주삼아 오징어 씹듯이 씹어대는 습관이 다반사다. 술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야기 그물에서 배제되고, 누적되면 관계의 그물에서도 배제되기 십상인 것이 우리 술문화의 단면이다. 술은 그 자체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이며 메시지이기 때문에, 술자리의 동석(同席) 여부가 특정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에서의 귀속과 배제를 알려주는 단서(端緖)가 되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존경받던 사람이 술자리에선 개차반이 되어 술자리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대부분 술을 잘못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술자리의 꼴불견으로 꼽는 유형은 술버릇이 나쁜 사람, 분위기를 못 맞추는 사람, 억지로 술을 권하는 사람, 술값을 안내는 사람, 술자리에서 속내를 비춰야할지 안 해야 할지 경계가 되는 사람 등인데, 개차반이 되어도 술값 잘 내면 다음 자리에 불러주지만 술값도 안 내고 분위기만 망치는 사람은 차후 제명(?)처분 받는 게 통상이다.
1920년대에 주당들이 만든 ‘음주법’ 제9조(무전취식)에는 ‘빈대’라 하여 △계산 시 신발 끈을 매는 경우(심한 경우 묶었던 신발 끈을 푸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워커를 신고 오는 뻔뻔스러운 자도 있다. 술을 마실 경우에는 미리 회비를 받아두어야 한다.) △계산 시 화장실에 가는 경우(생리현상이 계산 시 집중되는 일이 연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화장실 다녀올 때까지 계산을 미루거나 술집 사장에게 화장실 간 사람이 계산할 거라는 귀띔을 하고 나간다.) △술 마시는 도중에 참여한 경우(술 마시는 도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연 5회 이상 회비 납부를 거부하며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게는 2차 계산을 명할 수 있다.) △무일푼이 고가의 술을 원하는 경우(지갑에 1000원짜리 몇 장 들고 나이트 가자며 분위기 띄우는 경우 지갑을 확인한 후 ‘쿠사리’를 주어 행위의 반복을 금하게 한다.) 등의 예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실 때는 신나게 마셨지만 막상 계산하려면 술이 확 깨기 마련인 것이 보통사람들의 새가슴이다. 옛날에도 그러했거늘 요즘이라고 변할 것인가. 현대인들은 이를 가리켜 ‘술의 경제학(經濟學)’이라 부르면서 술자리가 끝나고 계산대로 나아가는 동작을 묘사한다. △어떤 이는 옆에 있는 신발을 못 본 채 하며 찾아 헤매는 동작을 취하고 △어떤 이는 앞뒤 걸어 나가는 사람을 다시 불러 전혀 심각하지 않은 얘기를 몰두해서 하기 시작하며 △어떤 이는 이 시간이 올 때쯤이면 이상하게 열변의 장광설(長廣舌)을 멈추고 코를 골기 시작하고 △결국 ‘잘나가는 놈’과 ‘성질 급한 놈’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 술의 경제학(?)이라는 것이다.
술은 결코 개인의 기호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상징이라는 것을 되새겨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