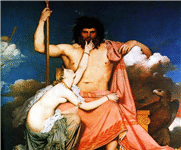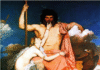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진도에서 書·畵·歌·舞 자랑마라
바람 따라 가듯 남쪽 끝 그 섬으로… 나는 가리

진도에 가면 서화가무(書畵歌舞)가 넘쳐난다. 글씨면 글씨, 그림이면 그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어느 것 하나 어디엘 내 놔도 뒤지는 것이 없다.
문화재로는 용장리의 용장산성(龍藏山城, 사적 제126호), 남동리의 남도석성(南挑石城, 사적 제127호) 등과 첨찰산 남쪽 기슭에 쌍계사, 운림산방(雲林山房) 등이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인 강강술래, 제51호인 남도들노래, 제72호인 진도씻김굿 등이 있다. 진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요인 ‘진도아리랑’의 발상지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박수길 과장은 “진도는 깨끗한 자연환경 말고도 70여종의 유·무형 문화재가 있다”면서 “그 밖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도의 백조도래지(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의신면의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07호), 진도 임회면의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111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박수길 과장은 “진도는 깨끗한 자연환경 말고도 70여종의 유·무형 문화재가 있다”면서 “그 밖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도의 백조도래지(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의신면의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07호), 진도 임회면의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111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디 그뿐인가.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는 신비의 바닷길은 이제 한국 사람들만이 볼거리가 아니다. 세계인들이 바다가 갈라질 때를 먼저 알고 달려올 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소가 진도에 있다.
진도는 홍도나 외도처럼 빼어난 경관은 없더라도 섬들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가 일품이며, 강강수월레 자락에 흥이 겨우면 붉디붉은 홍주나 울금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며 서도민요에 젖어든다.
돌아온 백구처럼 한번 주인에게는 영원히 충성을 맹세하는 진돗개가 있는 한 이순신 장군이 지켜낸 진도는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그런 진도를 김성화 시인은 ‘그 섬에 가리’라는 시에서
‘바람 따라 가듯/ 길 없어도/ 바다를 향해 가슴을 열고/ 너에게 가리/ 일곱 빛깔 영롱한 별빛아래/ 바다와 하늘이 몸을 섞으며/ 슬픔을 묻는 곳/ 그 섬에 가리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돌아온 길 돌아다 보며/ 먼 하늘 한 자락 눈에 묻고/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서 있는/ 남쪽 끝 그 섬으로/ 나는 가리’라고 노래했다.
기자의 마음도 시인 따라 진도로 간다.
◇ 새삼 진도의 속살을 보다
 진도를 찾은 것이 이번 말고도 서너 번이나 되었으니 내심 진도의 속살을 본 것 같았는데 이번 진도가 실시한 팸투어에서 새삼 진도의 진면목을 많이 본 것 같았다. 이는 진도 군청이 진심으로 팸투어단을 맞이 해준 것도 있으려니와 진도군문화관광해설사 도팍 이평기 씨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진도를 찾은 것이 이번 말고도 서너 번이나 되었으니 내심 진도의 속살을 본 것 같았는데 이번 진도가 실시한 팸투어에서 새삼 진도의 진면목을 많이 본 것 같았다. 이는 진도 군청이 진심으로 팸투어단을 맞이 해준 것도 있으려니와 진도군문화관광해설사 도팍 이평기 씨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의 입담도 입담이려니와 해박한 지식은 참관자들의 마음을 홀리기에 충분했다. 겉으로 드러난 볼거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작가의 마음을 읽고 참관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도 다 방면에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알려주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끼들이 뭉쳐서 오늘날 진도를 珍島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도팍’은 전라도 말로 ‘돌멩이’이라는 뜻이다. 도팍 보다는 보통 ‘도파기’라고 한다. 도파기 해설사 이평기 씨는 현재 진도군내 36명 해설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다. 자 지금부터 도파기 해설사를 따라 길을 나서보자.
우초(愚艸) 박병락(朴秉洛) 화가가 터 잡고 있는 갤러리는 진도의 바닷물이 턱 밑까지 밀려오는 임회면 헌복동길에 있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이면서 화가인 그는 현재 갤러리 안에서 작은 식당도 겸하고 있다. 찾아간 팸투어단 앞에서 묵화 한 점을 그려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허연 화선지가 금세 바닷가로 변한다. 벌거벗고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다. 채색이 더한 수묵화는 동적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홍매화가 꽃바람 되어 날리는 풍경화에서 우리는 어느 봄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 정약용 선생의 매화에 빠지다
지금 진도군 임희면에 위치하고 있는 長田미술관(구, 南辰미술관)에서는 ‘동행-장전의 묵향 속으로’라는 테마로 ‘2013년 진도 거주 작가 초대 기획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서화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정약용 선생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장전미술관을 찾아 볼 것을 권한다. 왜냐 하면 정약용 선생이 직접 그린 매화도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 매화도는 그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귀한 그림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그림이다.
장전미술관은1987년에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河南鎬, 1926~2007) 선생이 세운 것으로, 1992년 문화부에 등록되었다. 총면적 1097㎡, 지상 3층의 건물을 전시관으로 사용한다. 미술관 명칭은 설립자 하남호 선생의 남(南)자와 부인 곽순진 여사의 진(辰)을 합하여 지은 것이다. 그러던 것을 가족들이 지난 3월4일 이름을 長田으로 바꿨다.
미술관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도자기 등 3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5개의 전시실에 각 분야에 걸쳐 조선시대 이후 작고한 작가, 원로작가, 중견작가와 현대작가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두루 전시하고 있다. 고려청자와 이조백자는 별도의 주제로 진열되어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 된 것 아세요?

한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으랴만 우리민족 만큼 한이 많은 민족도 드물 것 같다. 이런 한을 마음속에서 풀어낸 노래가 아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아리랑은 진도 아리랑을 비롯, 정선 아리랑, 밀양아리랑을 3대 아리랑이라 쳐주지만 충청도에도 함경도에도 있다. 진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리랑마을’을 조성하고 아리랑체험관을 만들었다.
언뜻 보면 아리랑 체험관은 큰 장구 모양 같다. 그 속에 진도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 아리랑의 역사가 녹아 있다.
진도 아리랑은 지난 해 12월 6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확정된 것을 계기로 진도군은 ‘진도아리랑’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아리랑 테마 관광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임회면 상만리 11만1180㎡ 부지에 조성된 ‘아리랑 마을’이 그곳이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아리랑 체험관’은 아리랑 마을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아리랑의 유래를 비롯해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리랑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역사 아리랑 전시실’에선 아리랑의 역사와 국내외에 산재한 아리랑 관련 문헌·영상·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진도아리랑 전시실’에서는 진도아리랑의 유래와 진도 문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날 두고 가신 임은 가고 싶어 가느냐./ (후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리라가 났네~.
진도군은 이런 아리랑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아리랑마을을 ‘민속문화특구’로 지정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 가슴 뭉클하다. 아름다운 세방낙조여
 스케줄을 대충 훑어 봤을 때 “오늘 저녁은 세발 낙지를 먹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 말고 누구도 그런 생각을 했단다. ‘세방낙조’가 ‘세발낙지’로 뒤바뀐 사연은 그렇다 치고 ‘세방낙조’에서 바다가 해를 먹어치우는 장관을 볼 수 있다는데 무한 감사를 드린다.
스케줄을 대충 훑어 봤을 때 “오늘 저녁은 세발 낙지를 먹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 말고 누구도 그런 생각을 했단다. ‘세방낙조’가 ‘세발낙지’로 뒤바뀐 사연은 그렇다 치고 ‘세방낙조’에서 바다가 해를 먹어치우는 장관을 볼 수 있다는데 무한 감사를 드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해무가 끼여 황홀한 낙조는 감상하지 못했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루를 아쉬워하며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며 손짓하는 태양이 있었다.
세방낙조에는 해질 무렵이 되면 어디선가부터 꾸역꾸역 사람들이 낙조를 보러 모여든다. 섬과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일몰의 장관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면 “야! 멋있다” 사방에서 카메라가 바쁘다. 하루가 서서히 저문다. 객은 잠자리를 찾아 나선다.
 특히 이날 세방낙조전망대에는 팸투어단을 위해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특별공연을 펼쳤다. 진도아리랑을 비롯해 북춤으로 이어진 공연은 관객의 어깨가 절로 으쓱대게 만든다. 진도의 또 하나 자랑거리인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 씻김굿, 다시래기, 진도만가 등을 공연한다. 20명 이상 단체가 요청하면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소정의 출연료를 받고 공연도 해준다고 한다.
특히 이날 세방낙조전망대에는 팸투어단을 위해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특별공연을 펼쳤다. 진도아리랑을 비롯해 북춤으로 이어진 공연은 관객의 어깨가 절로 으쓱대게 만든다. 진도의 또 하나 자랑거리인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 씻김굿, 다시래기, 진도만가 등을 공연한다. 20명 이상 단체가 요청하면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소정의 출연료를 받고 공연도 해준다고 한다.
 진도의 대표적인 명소인 울림산방, 남도진성, 용장성, 신비의 바닷길, 진도대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언급을 자제 한다. 이런 것은 이미 너무 알려졌기에 주언 부언 늘어놓는다는 것이 입 다물고 있음만 못할 것 같아서다.
진도의 대표적인 명소인 울림산방, 남도진성, 용장성, 신비의 바닷길, 진도대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언급을 자제 한다. 이런 것은 이미 너무 알려졌기에 주언 부언 늘어놓는다는 것이 입 다물고 있음만 못할 것 같아서다.
조병화 시인은 ‘진도찬가(珍島讚歌)’라는 시에서 “진도에는 놀고 있는 땅이 없고, 한 해 농사를 지어 삼 년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은 기름지다”고 했고, “해산물뿐만 아니라 들녘에서도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고려시대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로 들어온 연유를 알겠다”고 적고 있다.
그 때만큼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옹색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빠져 나가 지금은 3만도 안 돼는 인구가 진도를 지키고 있다.
진도에 서화가무가 찬란하게 꽃필 수 있었던 것은 삼별초라든가 선비들의 귀양살이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특히나 진도의 유명한 씻김굿이나 다시래기 같은 것은 장사(葬事)를 지내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 때문일까 진도 사람들은 좋은 일 궂은 일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 민요 한 가락 정도는 너끈히 읊을 줄 알아야 진도 사람대접을 받는다. 발길 닿는 곳마다 “오메!”하는 소리를 추임새로 넣으면서 한판 신명나게 어우러진다.
TIP : 진도에서 색다른 먹거리를 찾는다면 진도읍내에 있는 묵은지(061-543-2242)식당을 들러보라. 이 식당은 문광부 지정 한국대표음식점 100선 중 한집. 이 식당은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고기로 유명하지만 ‘소고기 듬북국’을 맛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다.
듬북은 톳처럼 생겼지만 더 굵고, 통통하게 살이 쪘다. 듬북국은 사골 국물에다 끓이거나 소고기를 몇 점 넣어서 끓인다. 드문 일이지만 굴이나 바지락을 넣고 끓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집에서는 사골국물에다 키조개를 넣었다.
 <글, 사진 김원하 기자>
<글, 사진 김원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