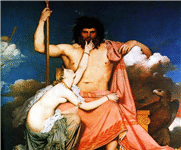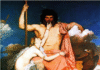溫故知新 박록담의 복원 전통주 스토리텔링(16)
이화주(梨花酒) 스토리텔링 및 술 빚는 법
 ‘이화주(梨花酒)’는 소위 “배꽃(梨花)이 필 때 술을 빚는다.” 또는 “배꽃이 필 때 이화곡(梨花麯)으로 빚는 술”이라고 하여 주품명을 얻게 되었다. ‘이화주’라는 주품명에서 떠올리게 되는 배꽃(梨花)이 사용되는 술은 아닌 것이다.
‘이화주(梨花酒)’는 소위 “배꽃(梨花)이 필 때 술을 빚는다.” 또는 “배꽃이 필 때 이화곡(梨花麯)으로 빚는 술”이라고 하여 주품명을 얻게 되었다. ‘이화주’라는 주품명에서 떠올리게 되는 배꽃(梨花)이 사용되는 술은 아닌 것이다.
‘이화주’는 고려시대 때부터 빚어졌던 고급탁주로 전해오고 있는데, 고려 말기 대표적인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東國李相國集>에 ‘한식날에 기다리는 이 오지 않고(寒食日待人不至)’라는 시(詩) 가운데 “백오일(한식일) 좋은 날에 사람은 오지 않고(百五佳辰人不來), 그네 그림자 밖으로 석양이 지네(鞦韆影外夕陽廻). 살구 엿과 ‘보리술’은 모두 한가한 일이니(杏餳麥酪渾閑事), ‘이화주’나 마주하여 한잔 마시네(只對梨花飮一杯).”라고 하여 ‘이화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이화(梨花)를 ‘이화주’가 아닌, 꽃(梨花)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으나, 문장의 앞뒤로 미루어 한가한 때 마시는 ‘보리술’과 달리 명절인 한식날에 손님을 청하여 마시는 술이라면, ‘이화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러한 ‘이화주’는 그 형태나 빛깔이 희고 된죽 같아 그냥 떠먹기도 하고, 한여름에 갈증이 나면 찬물에 타서 막걸리로 마시기도 하는데, 여느 술과는 달리 누룩도 ‘이화곡’이라고 하여 특별히 쌀로 빚는다고 해서 ‘이화주’라는 주품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화주’는 구멍 떡이나 흰무리를 만들어 빚는 것이 특징으로, 누룩을 비롯하여 술 빚는데 사용되는 쌀의 양이나 정성에 비해, 그 양도 적고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일반 서민층에서는 쉽게 빚어 마시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부유층이나 사대부가에서 나이 많은 노인과 갓 젖을 뗀 어린 아이들의 간식으로 곧잘 애용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탁주라고 하면, 밀로 만든 막누룩에 가급적 적은 양의 쌀로 술을 빚고, 물을 타서 양을 늘려서 마셨던 까닭에 쌀누룩과 쌀로 빚은 술은 값이 비싸, 서민층에선 비경제적인 술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나, 그 맛과 향이 독특한 데서 대중적으로 사랑받았을 것이며, 특급탁주로 불리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이화주’와 같은 특급탁주류는 일반 탁주나 막걸리 등으로 불리지 않고 특별하게 고유 명칭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혼돈주’를 비롯, ‘하일절주’, ‘급시주’, ‘벼락술’, ‘층층지주’, ‘유화주’ 등이 그 예다.
이화주는 <甘藷種植法>을 비롯하여 <攷事新書>, <攷事十二集>, <규중세화>, <閨閤叢書>, <金承旨宅廚方文>, <農政會要>, <達生秘書>, <東醫寶鑑>, <山家要錄>, <山林經濟>, <需雲雜方>, <술 만드는 법>, <술방>, <양주방>, <양주방(釀酒方)>, <諺書酒饌方>, <曆酒方文>, <蘊酒法>, <要錄>, <禹飮諸方>, <음식디미방>, <飮食方文>, <李氏음식법>, <林園十六志>,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酒方>, <酒方文>, <주방문造果法>, <酒饌>, <增補山林經濟>, <浸酒法>, <韓國民俗大觀>, <海東農書> 등 33종의 문헌에 47차례, 하절 이화주가 4차례나 등장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 문헌 기록으로는 네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으며, 이렇게 많은 문헌에 등장 하는 것도, 바로 ‘이화주’가 사대부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빚어 마셨고, 점차 일반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 문헌 기록으로는 네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으며, 이렇게 많은 문헌에 등장 하는 것도, 바로 ‘이화주’가 사대부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빚어 마셨고, 점차 일반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느 주품들에 비해 민간에서 널리 빚어 마시는 등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대중적인 인지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에 맞아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술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화주’라는 명칭의 유래와 관련하여 ‘이화주’가 “배꽃 필 때 술을 빚는다.”는 술인가, 아니면 “배꽃 필 때 누룩(이화국)을 빚는다.”는 술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술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화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고, 자칫 그 의미를 호도하여 순수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화주’를 수록하고 있는 33권의 문헌 가운데, ‘이화곡’ 제조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27종으로, 총 31차례 등장한다. 이들 문헌에 수록된 주방문을 중심으로 ‘이화곡’ 빚는 시기를 분석하여 보면, <甘藷種植法>을 비롯하여 17종의 문헌에서 ‘음력 정월 첫 해일’ 또는 ‘음력 정월 상순’, ‘음력 정월 첫 돌날’, ‘정월 보름날’이라고 하였고, <山家要錄>을 비롯하여 4종의 문헌에서 ‘음력 이월’, <음식디미방>을 비롯하여 6종의 문헌에서 ‘배꽃 필 때’, ‘복숭아꽃 필 때’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醞酒法>에서는 ‘삼월상순’과 ‘하절’, <要錄>의 경우 누룩 빚는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이화주’를 빚는 시기에 대하여 <규중세화>를 비롯하여 <閨閤叢書>, <山家要錄>, <양주방>, <諺書酒饌方>, <醞酒法>, <음식디미방>, <李氏음식법>,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酒方>, <酒方文>, <酒方文造果法>, <浸酒法> 등 13종의 문헌에서 ‘배꽃 필 때’를 전후하여 빚는다는 것을 15차례 확인할 수 있고, <甘藷種植法>, <攷事新書>, <攷事十二集>, <農政會要>, <山林經濟>, <술 만드는 법>, <양주방>, <曆酒方文>, <醞酒法>, <음식디미방>, <林園十六志>, <酒饌>, <增補山林經濟>, <浸酒法> 등 14종의 문헌에서 ‘여름에’ 빚는다는 것을 15차례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需雲雜方>, <술방>, <양주방(釀酒方)>, <醞酒法>, <要錄>, <禹飮諸方>, <飮食方文>, <酒方文造果法>, <酒饌>, <韓國民俗大觀> 등 10종의 문헌에서 술 빚는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술을 빚는 방법에 대한 주방문을 13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이화곡(梨花麯)은 ‘음력 정월’이나 ‘음력 이월’에 빚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화주(梨花酒)’는 ‘배꽃 필 때’와 ‘여름철’에 필요에 따라 빚는 술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 예로 <蘊酒法>과 <酒饌>, <韓國民俗大觀>에에 ‘하절이화주’, <음식디미방>에 ‘이화주법(여름에 빚는 법)’이라는 주품명의 주방문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이화주’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 ‘이화곡’의 사용에 따른 주품명으로, 겨울철인 ‘음력 정월이나 이월’ 또는 ‘배꽃 필 때’ 빚은 전용 누룩인 이화곡을 사용하여 ‘배꽃이 필 무렵’에 술빚기를 시작하여 여름철까지 빚어 마시는 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화주’의 정의는 “이화곡을 사용하여 배꽃이 필 때 술을 빚기 시작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겠다.
한편, <韓國民俗大觀>에 ”탁주류에도 일반 탁주류와 특별한 탁주류가 생기게 되었다. 일반 탁주류와 일반 청주류를 만들 때는 밀누룩이 쓰이고 있는데, 순(특별) 탁주류에는 쌀누룩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일반 탁주류는 ‘탁배기’라고 불러왔고, 특별한 방법으로 빚은 탁주는 고유 명칭을 붙여 왔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막걸리’라는 것은, 양조 후에 술을 떠내고 나머지에 물을 둘러 얻어진 것을 이르기도 했다.”고 하여 ‘막걸리’의 유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이래 ‘이화주’로 알려진 술이 대표적인 탁주였다. 가장 소박하게 만들어진 술, ‘막걸리’는 막걸리용 누룩을 배꽃이 필 무렵에 만든 데서 유래하여 ‘이화주’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누룩을 아무 때나 만들게 되었으므로, ‘이화주’란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였다. 특히 ‘이화주의 형태가 일반 탁주나 막걸리와는 다른, ‘이화주’는 맑은 술이 아니고, 된 죽과 같고 빛깔은 흰데 물을 타서 마셨다.”고 하여 용도와 목적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화주’는 문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화주’를 빚는 법은 구무떡(구멍떡), 백설기, 죽, 범벅 등 당야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개 구멍 떡으로 빚고 그 과정도 비슷하다.
조선시대 31종의 문헌에 수록된 ‘이화주’ 빚는 법을 분석하여 보면, <山家要錄>을 비롯하여 <諺書酒饌方>, <需雲雜方> 등 29종의 문헌에서 ‘구멍 떡(孔餠)’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32차례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醞酒法>과 <要錄>, <閨閤叢書>, <韓國民俗大觀>에서 ‘물송편’으로 빚는 경우를 4차례 확인할 수 있었으며, <曆酒方文>과 <醞酒法>에서 ‘백설기(白餠)’로 빚는 경우를 3차례, <需雲雜方>과 <醞酒法>, <禹飮諸方>에서 ‘죽’으로 빚는 경우 3차례, <규중세화>에서 ‘범벅’으로 빚는 경우를 1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 <東醫寶鑑>과 <達生秘書>에서는 술빚는 법이 없이 ‘이화주’의 특징과 맛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화주’를 빚을 때는, 쌀가루를 가능한 곱게 빻고 깁체를 시용하여 여러 차례 내려 무거리를 제거하고, 뜨거울 정도의 따뜻한 물을 뿌려가면서 오랫동안 치대어 무른 송편반죽처럼 만들면 좋다. 익반죽을 한주먹 크기로 떼어서 둥글납작한 경단처럼 빚되,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구멍 떡을 만들어 끓는 물에 넣고 삶는데, 익어서 떠오르되 가라앉지 않으면 다 익은 것이니, 건져내어 식기 전에 한 덩어리로 짓이겨 놓으면 술을 빚을 때 편하다. 떡이 식어서 잘 풀리지 않으면 떡을 삶았던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짓이겨서 마르지 않게 식기를 기다려야 한다. 떡은 가능한 강제로 식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떡이 차게 식었으면 이화곡을 가루로 빻고 여러 차례 깁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만을 사용하는 것이 술도 맛있고, 발효를 고르고 잘 일어나도록 하는 비결이다.
차게 식은 떡에 이화국가루를 섞고 힘껏 치대어 술밑을 빚는데, 술밑이 녹은 엿가락처럼 늘어지면 다 된 것이므로 술독에 담아 안치는데, 이때 꼭꼭 눌러서 다져 담는 것이 요령이다. 떡과 누룩가루 외에 물을 넣지 않는 까닭에 누룩가루가 골고루 섞이지 않는데, 잘 섞어지게 하려면 절구에 담고 절굿공이로 눌러 이기거나, 누룩가루를 혼합하기 전에 미리 고운 엿기름가루를 조금 넣고 주물러대면, 떡반죽이 물러져서 누룩가루를 혼합기가 용이하다.
‘이화주’의 또 다른 특징으로 술맛을 달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독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 누룩가루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일체 날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술이 산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술독은 여러 겹의 한지나 면보를 사용하여 밀봉하되 절대로 따뜻한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 서늘하면서도 차지 않는 곳에 얇은 이불로 한두 겹 덮어두면 좋다. 또한 여름철에 빚을 경우에는, 술독을 서늘한 물에 담가 두고 술을 익히면, 술이 지나치게 끓어 넘치거나 산패하는 일이 없어 좋다. 이렇게 하여 발효가 끝난 ‘이화주’는 흡사 농축 야쿠르트와 같은 된죽 형태를 띠며, 그 빛깔은 엷은 미색이거나 흰색을 간직하고 있어, ‘백설향(白雪香)’이란 별명을 얻었다.
흔히 달고 부드러운 맛을 가리켜 ‘달보드레하다’는 말을 쓰는 것을 보는데, 바로 ‘이화주’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독특한 맛과 향이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냉수에 타서 막걸리로 마시면 한결 시원한 맛과 함께 갈증까지 씻어준다.
◈ 니화쥬 <諺書酒饌方>
 ◇ 이화곡 빚는 법:①정월 보름날 멥쌀 5말을 백세 하여, 새 물에 헹궈낸다. ②씻은 쌀을 다시 새물에 담가서 밤재워 불린다. ③다음 날 불린 쌀을 한 번 더 (씻어) 헹궈서 뜨물이 없이 한 다음, 물기를 빼서 가루로 빻는다. ④쌀가루를 체로 쳐서 내린 후, 다시 물을 알맞게 쳐서 한 번 더 내린다. ⑤ 쌀가루를 두 손으로 쥐어서 오리 알만 한 크기로 단단히 뭉쳐서 누룩밑을 빚는다. ⑥누룩밑을 볏짚으로 싸되, 배 싸듯하여 공석에 짚으로 격지격지 묻어 더운 구들에 놓고 공석으로 덮어준다. ⑦7일 후에 뒤집어 놓고, 14일 후에 또 뒤집어 놓고, 띄우기 시작한지 21일 만에 꺼낸다. ⑧즉시 더러운 껍질을 벗기고, 한 덩어리를 서너 조각으로 깨어 석작에 담아 놓는다. ⑨홑보자기로 석작을 덮어놓고 날마다 햇볕에 내어 말려 둔다.
◇ 이화곡 빚는 법:①정월 보름날 멥쌀 5말을 백세 하여, 새 물에 헹궈낸다. ②씻은 쌀을 다시 새물에 담가서 밤재워 불린다. ③다음 날 불린 쌀을 한 번 더 (씻어) 헹궈서 뜨물이 없이 한 다음, 물기를 빼서 가루로 빻는다. ④쌀가루를 체로 쳐서 내린 후, 다시 물을 알맞게 쳐서 한 번 더 내린다. ⑤ 쌀가루를 두 손으로 쥐어서 오리 알만 한 크기로 단단히 뭉쳐서 누룩밑을 빚는다. ⑥누룩밑을 볏짚으로 싸되, 배 싸듯하여 공석에 짚으로 격지격지 묻어 더운 구들에 놓고 공석으로 덮어준다. ⑦7일 후에 뒤집어 놓고, 14일 후에 또 뒤집어 놓고, 띄우기 시작한지 21일 만에 꺼낸다. ⑧즉시 더러운 껍질을 벗기고, 한 덩어리를 서너 조각으로 깨어 석작에 담아 놓는다. ⑨홑보자기로 석작을 덮어놓고 날마다 햇볕에 내어 말려 둔다.
◇ 이화주 빚는 법:① 배꽃이 피려할 때 법제해 둔 이화곡을 작말하여 가는체로 두 번 쳐서 고운 가루를 내려놓는다. ②멥쌀 1말을 일백 번 씻어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다시 씻어 헹궈 건져서 물기를 뺀 후,) 가루로 빻는다. ③쌀가루를 가는체로 쳐서 고운 가루를 내린다. ④물솥에 물을 많이 붓고 끓이다가 물이 뜨거워지면, 뜨거운 물(1되 5홉가량)을 쌀가루에 골고루 뿌려서 익반죽한다. ⑤익반죽은 매우 치대서 수분을 고르게 하고 한주먹씩 떼어 구멍 떡을 빚는다. ⑥솥의 물이 끓으면 구멍 떡을 넣고 많이 무르게 삶아, 물 위에 떠오르면 자배기에 건져낸다. ⑦건져낸 떡을 주걱으로 짓이겨서 풀같이 풀고, 뚜껑을 덮어 식기를 기다린다. ⑧식은 떡을 조금씩 내어 구유에 담고, 누룩가루를 섞는데, 쌀 되던 되로 쌀 1말에 누룩가루 5되씩 넣는다.
⑨떡반대기에 누룩가루 5되를 섞고, 손으로 치대기를 서너 번 하여 술밑을 빚는다. ⑩떡반대기가 너무 말라 어우러지지 않으면, 떡 삶은 물을 차게 해서 뿌리고 다시 쳐서 손바닥만큼 만든다. ⑪술밑이 가장 차거든 술독에 넣되, 독 가장자리로 채우고 가운데를 비게 하여 3~4일간 삭힌다. ⑫3~4일 째 열어보아 더운 기운이 있거든 다시 퍼서 식히고, 다시 안쳐서 독을 서늘한 곳으로 옮겨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