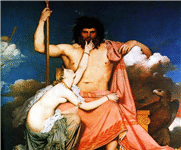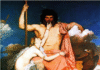우리 고유의 전통 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한 바 있어,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겠다. 다만, ‘경액춘(瓊液春)’과 관련하여 자전적 풀이를 하자면 ‘옥 빛깔 같이 맑고 밝아 아름다우면서도 그 맛이 꿀처럼 끈끈하고 진한 술’ 쯤으로 해석되는데, 실제적인 술빚기에 있어서는 ‘술 빛깔이 말고 깨끗하다’는 장점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나 특징 지을만한 맛과 향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우리 고유의 전통 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한 바 있어,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겠다. 다만, ‘경액춘(瓊液春)’과 관련하여 자전적 풀이를 하자면 ‘옥 빛깔 같이 맑고 밝아 아름다우면서도 그 맛이 꿀처럼 끈끈하고 진한 술’ 쯤으로 해석되는데, 실제적인 술빚기에 있어서는 ‘술 빛깔이 말고 깨끗하다’는 장점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나 특징 지을만한 맛과 향기를 찾을 수는 없었다.
‘경액춘(瓊液春)’에 관하여 <酒饌>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 외의 다른 방문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林園十六志>와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 다른 설명 없이 동일 명칭의 ‘경액춘(瓊液春)’을 찾을 수 있었다.
<酒饌>을 비롯하여 <林園十六志>와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방문이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酒饌>을 비롯하여 <林園十六志>나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수록되어 있는 ‘경액춘(瓊液春)’은 밑술과 덧술에서 술 재료의 양이나 빚는 과정이 동일하면서, 문헌마다의 발간 시기는 다르지만 그 주방문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주방문을 보면 <林園十六志>에서는 ‘백찬(白燦) 5말을 3일간 물에 담갔다가 작말하여 끓는 물 7말로 죽을 개어 차게 식힌 뒤, 누룩가루 7되와 내면(진말) 3되를 섞어 항에 담아 안친다’고 하였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흰쌀 5말을 물에 담근 지 사흘 만에 세말하여 익게 쪄서 끓는 물 7되를 붓고, 식거든 누룩가루 7되와 밀가루 3되를 섞고, 모두 버무려 독에 넣고 익기를 기다려서…’라고 하였으며, <林園十六志>의 ‘경액춘(瓊液春)’도 주찬과 다를 게 없다. 다만, <酒饌>의 ‘경액춘(瓊液春)’은 밑술의 쌀을 하룻밤 불린다고 하였는데, <林園十六志>와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3일간 불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미 언급하였듯, <林園十六志>에서 ‘경액춘(瓊液春)’의 주재료는 ‘백찬(白燦)’, <酒饌>에서는 ‘백미(白米)’,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흔쌀(흰쌀)이라고 하여 문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酒饌>의 ‘경액춘(瓊液春)’ 방문을 살펴보면, 밑술의 쌀을 하룻밤 불렸다가 작말한 뒤, 쪄서 만든 설기떡에 끓는 물을 섞어 다시 죽 형태로 만들어 식은 후에 누룩과 밀가루를 섞어 술밑을 빚고, 밑술이 익기를 기다려 찹쌀로 고두밥을 지은 후, 다시 끓는 물과 혼합하여 고두밥을 다시 한 번 퍼지게 익혀 차게 식으면 밑술과 합하여 덧술을 빚는 과정의 방문을 보여주고 있다. <酒饌> 보다 시대가 앞선 기록인 <林園十六志>에서는 밑술의 쌀을 보다 더 오랫동안 불려서 술을 빚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대별로 세 가지 문헌 마다의 주방문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술을 빚는 방법의 과학화와 기교 등 보다 진보하는 양조기술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酒饌>에서는 쌀을 하룻밤 침지하여 가루로 만든 다음 시루에 쪄낸 설기를 다시금 끓는 물에 풀어 죽으로 만드는 방문은 일반적인 죽(粥)의 다른 방편이라고 할 수 있고, <酒饌> 보다 시대가 앞선 기록인 <林園十六志>와 <酒饌> 보다 후기의 기록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방법은 같지만 쌀의 침미 시간에 따른 발효특성이 달라진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보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술을 얻기 위한 양주기술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백설기로 빚는 술의 문제점과 과정상의 어려움은, 누룩과의 혼화가 쉽지 않고, 또 발효과정에서 술밑이 지나치게 끓어 자칫 술독 밖으로 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술빚기를 강구하게 되었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액춘(瓊液春)’과 같은 보다 부드럽고 맛이 진하며 향기가 좋은 명주로 자리를 잡아 춘주로서의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봉접요람>이란 음식관련 한글 필사본이 최근에 발굴되었는데, <봉접요람>은 저자와 발간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00년대 문헌으로 짐작된다. <봉접요람>에 ‘경앵춘법’이라 하여 주방문이 등장하는데, <酒饌>을 비롯한 다른 기록과는 주재료의 배합비율이 차이가 있으나, 술 빚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액춘(瓊液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봉접요람>의 ‘경액춘법(瓊液春法)’은 <酒饌>을 비롯한 세 가지 문헌에 수록된 ‘경액춘(瓊液春)’에 비해 20% 정도 되는 재료배합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술 빚는 과정도 밑술은 백설기를 찌고 끓는 물과 합하여 죽 형태로 다시 익혀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빚는 과정이 같고, 덧술도 고두밥을 찐 후에 끓는 물과 혼합하여 진밥 형태로 다시 익히는 과정을 거쳐 밑술과 섞되, 밀가루 없이 누룩만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덧술 과정에서 밀가루가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하여 <봉접요람>의 ‘경액춘’이 <酒饌> 등의 ‘경액춘(瓊液春)’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酒饌> 등의 주방문과 같이 재료의 양이 많은 경우와, <봉접요람>의 예와 같이 주재료의 양이 적은 술에서 밀가루를 2차례에 걸쳐 사용할 경우, 오히려 산미(酸味)가 강해지고, 느끼한 맛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덧술에서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일부러 넣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전통주의 발달과정을 살피건대, <酒方文>이 등장하는 160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800년대 후반까지는 가장 많은 수의 전통주와 다양한 방법의 주방문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별법이나 우법, 우방, 일방 등 본방을 응용한 다양한 주품들이 가양주로 또는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경액춘(瓊液春)의 특징 및 술빚는 법
경액춘(瓊液春)의 특징 및 술빚는 법
瓊液春 <酒饌>
술재료
밑술:멥쌀 5말, 누룩가루 7되, 밀가루 3되, 끓는 물 7말
덧술:멥쌀 10말, 누룩 5되, 탕수 8말
술 빚는 법
밑술:① 멥쌀 5말을 백세 하여 물에 담가 하룻밤 불렸다가, (다시 씻어 헹궈서 물기를 뺀 후,) 작말하여(가루로 빻아) 넓은 그릇에 담아 놓는다.② 쌀가루를 시루에 안쳐 백설기를 쪄 낸다 ③ 솥에 물 7말을 끓이고, 백설기가 다 익었으면 큰 그릇 서너 개에 퍼 담고, 끓는 물 7말을 백설기에 골고루 나누어 붓고, 주걱으로 고루 휘저어 놓는다. ④ 백설기가 물을 다 먹었으면, 주걱으로 개서 멍우리 없는 죽처럼 만들고, 다시 그릇 여러 개에 나눠서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⑤ 죽처럼 된 떡에 누룩가루 7되와 밀가루 3되를 합하고, 고루 힘껏 치대어 술밑을 빚는다. ⑥ 술독에 술밑을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3일간) 발효시킨다.
덧술:① 물 8말을 팔팔 끓여 식혀 놓는다. ② 멥쌀 10말을 백세 하여 물에 담가 하룻밤 불렸다가, (다시 씻어 헹궈서 물기를 뺀 후) 시루에 안쳐서 무른 고두밥을 짓는다. ③ 고두밥이 익었으면 퍼내고, 고루 펼쳐서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④ 고두밥에 식혀 둔 물 8말과 밑술, 누룩 5되를 합하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⑤ 술독에 술밑을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21일간) 발효시킨다.
瓊液春方 <임원십육지>
술재료
밑술:멥쌀 5말, 누룩가루 7되, 밀가루 3되, 끓는 물 7말덧술:멥쌀 10말, 누룩가루 5되, 끓는 물 8말
술 빚는 법
밑술:① 멥쌀 5말을 (백세 하여) 물에 담가 3일간 불렸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를 뺀 후,) 고운 가루로 빻는다. ② 쌀가루를 시루에 안쳐 무르게 익게 찐 다음, 솥에 물 7말을 붓고 끓인다. ③ 쌀가루에 끓는 물을 합하고, 주걱으로 고루 개어 범벅처럼 만든 죽을 다음, 넓은 그릇 여러 개에 나눠 담고,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④ 차게 식힌 죽에 국설(麴屑 : 누룩가루) 7되와 밀가루 3되를 합하고, 고루 치대어 술밑을 빚는다. ⑤ 술밑을 술독에 담아 안친 후, 예의 방법대로 하여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은 곳에 앉혀서) 발효시키고, 술이 익기를 기다린다.
덧술:① 멥쌀 10말을 (백세 하여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를 뺀 후,) 시루에 안쳐 고두밥을 짓는다. ② 고두밥이 무르게 푹 익었으면, 끓는 물 8말을 고루 섞고, (넓은 그릇 여러 개에 나눠 담고)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③ 차게 식힌 고두밥에 국설(麴屑 : 누룩가루) 5되와 발효가 끝난 밑술을 섞어 넣고, 고루 버무려서 술독에 담아 안친다. ④ 술을 안친 술독은 예의 방법대로 하여,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은 곳에 앉혀서) 7~10일간 발효시킨다.
*<삼산방>을 인용하였다.
<원문> 경액춘방(瓊液春方):멥쌀 5말을 물에 3일 동안 담갔다가 곱게 가루 내어 쪄서 익힌 후 끓는 물 7말을 섞어 식으면 누룩가루 7되, 밀가루 3되를 섞어 술을 빚는다. 술이 익을 때쯤 멥쌀 10말을 푹 쪄서 끓는 물 8말을 붓고 누룩가루 5되를 섞어 밑술에 덧술 하여 빚는다.
경앵(액)춘법 <봉접요람>
술재료
밑술:멥쌀 1말, 가루누룩 1되 3홉, 진말 1되 3홉, 끓는 물 1말 3되
덧술:멥쌀 2말, 누룩 1되, 끓는 물 1말 7되
술 빚는 법
밑술:① 멥쌀 1말을 백세 하여 물에 담가 3일간 불렸다가, (다시 씻어 헹궈) 건져서 (물기를 뺀 다음) 작말한다(가루로 빻는다). ② 솥에 물 1말 3되를 끓이고, 쌀가루를 시루에 안쳐서 백설기 떡을 찐다. ③ 떡이 익었으면 넓은 그릇에 퍼 담고, 끓는 물 1말 3되를 떡에 합하고, 주걱으로 고루 개어 멍우리없이 풀어 놓고, 가장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④ 차게 식힌 떡에 가루누룩 1되 3홉, 진말 1되 3홉을 한데 합하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⑤ 술밑을 술독에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발효시켜서 익기를 기다린다.
덧술:① 찹쌀 1말을 백세 하여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다시 씻어 헹궈 건져서 물기를 뺀 후) 시루에 안쳐서 고두밥을 짓는다. ② 솥에 물 1말 7되를 끓이다가, 고두밥이 익었으면 넓은 그릇에 퍼내고, 끓는 물을 고두밥에 합한 후, 주걱으로 고루 개어 놓는다. ③ 고두밥이 물을 다 먹었으면, 고루 펼쳐서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④ 고두밥에 밑술과 누룩 1되를 한데 합하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⑤ 술밑을 술독에 담아 안치고, 예의 방법대로 하여 서늘한 곳에 앉혀서 14일간 발효시킨다.
* 방문에 “백미 두 말 백세 하여 담갔다가, 눅게 쪄 끓인 물 말 일곱 되로 누룩 한 되 넣어 전술에 섞어 빚었다가 익거든 쓰라”고 하였는데, 그 방법이 불분명하여, <임원십육지>의 경액춘방 덧술 방문을 참고하였다.
<원문> 백미 한 말 백세 하여 담갔다가 삼일 만에 건져 작말하여 익게 쪄 끓인 물 말 서 되 섞어 차거든 국말 되 서 홉 진말 닷 홉 섞어 빚었다가, 익거든 백미 두 말 백세 하여 담갔다가, 눅게 쪄 끓인 물 말 일곱 되로 누룩 한 되 넣어 전술에 섞어 빚었다가 익거든 쓰라.
瓊液春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술재료
밑술:멥쌀 5말, 누룩가루 7되, 밀가루 3되, 끓는 물 7되(말)
덧술:멥쌀 10말, 누룩가루 5되, 끓는 물 8말
술 빚는 법
밑술:① 멥쌀 5말을 물에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3일간 불렸다가,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가 빠지면 고운 가루로 빻는다. ② 쌀가루를 시루에 안쳐 무르게 익게 찐 다음, 끓는 물 7되(말)를 붓고 떡이 물을 다 먹었으면, 여러 그릇에 나눠 담고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③ 차게 식힌 떡에 누룩가루 7되와 밀가루 3되를 섞고 고루 버무려 술밑을 빚는다. ④ 술밑을 술독에 담아 안친 다음, 예의 방법대로 하여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은 곳에 앉혀서 한 달쯤 발효시킨 후), 익기를 기다려 덧술을 준비한다.
덧술 :① 멥쌀 10말을 (물에 깨끗이 씻어 하루 동안 불린 뒤, 다시 씻어 건져서 물기가 빠지면) 시루에 안쳐 무른 고두밥을 짓는다. ② 물 8말을 팔팔 끓여 고두밥에 섞고, 주걱으로 헤쳐서 고두밥이 물을 다 먹으면, 그릇 여러 개에 나눠 담고 차게 식기를 기다린다. ③ 차게 식힌 고두밥에 누룩가루 5되와 발효가 끝난 밑술을 섞어 넣고, 고루 버무려서 술밑을 빚는다. ④ 술밑을 술독에 담아 안친 다음, 예의 방법대로 하여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은 곳에 앉혀서) 발효시킨 후, 익기를 기다려 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