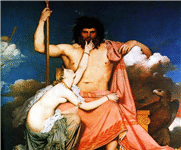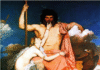정종이 아닌 소주라도 정성껏 올리자
김원하의 취중진담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이하면서 “정종 대신 새로운 차례주(茶禮酒)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거치면서 차례나 제사 때 대부분 일본 청주인 정종을 제주(祭酒)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신세대들 사이에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망자(亡者)가 생전에 초콜릿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제사상에 초콜릿을 올리고 골초였다고 해서 담배를 올리는 것처럼 평소 소주만 마셨다고 해서 소주를 제주로 올리기도 한다. 대가족 사회에서 급격히 핵가족 사회로 이동하다보니 유교적 관혼상례(冠婚喪禮)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각자 자기식대로 제사나 차례를 올리는 것이다.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이하면서 “정종 대신 새로운 차례주(茶禮酒)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거치면서 차례나 제사 때 대부분 일본 청주인 정종을 제주(祭酒)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신세대들 사이에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망자(亡者)가 생전에 초콜릿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제사상에 초콜릿을 올리고 골초였다고 해서 담배를 올리는 것처럼 평소 소주만 마셨다고 해서 소주를 제주로 올리기도 한다. 대가족 사회에서 급격히 핵가족 사회로 이동하다보니 유교적 관혼상례(冠婚喪禮)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각자 자기식대로 제사나 차례를 올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4대 봉사(奉祀)하거나 윗대 조상들을 함께 모시는 시제에선 약주류(類)의 전통주를 제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주는 제주로 쓰지 않는다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먼저 망자가 된 친구의 산소를 찾아갈 때 오징어 한 마리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찾아가는 장면을 심심찮게 본다.
‘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禮儀)’에는 제사에 쓰는 8가지 술, 오제삼주(五齊三酒, 오제는 범제(泛齊)·예제(醴齊)·앙제(盎齊)·체제(緹齊)·침제(沈齊)이며 삼주는 주(事酒)·석주(昔酒)·청주(淸酒)를 말한다)에 대해 언급돼 있다. 모두 저도수인 탁주와 청주다. 오제삼주는 중국의 ‘문헌통고’(文獻通考, 중국 고대로부터 남송 영종(寧宗) 때까지의 제도와 문물사(文物史)에 관한 책)’를 참조한 내용이고, 문헌통고 역시 주례(周禮)를 참고해서 내용을 구성했다고 한다.
주례가 완성된 형태로 된 것은 한나라(BC 206~AD 220년) 때인 만큼, 제주의 계보가 작성되고 나서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몽골족에 의해 증류주인 소주가 나타났다. 이후 중국이나 한반도에 소주(증류식)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소주의 역사를 놓고 보면 소주가 제사상에 오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세종실록오례의를 지을 때 지금처럼 소주가 일반화됐다면 제사 지내는 규범인 오제삼제에 소주를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릇 신(神)에게 제사하는 제물(祭物)은, 당시에 없는 것은 그 철에 나는 음식물로써 이를 대신한다고 고려조(高麗朝)의 상정례(詳定禮)에서 밝혔듯이 제주 역시 융통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시절에 맞게 제물을 제사상에 올리듯 술 또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은 예(禮)가 아닌 듯싶다. 우리 조상들은 금주령이 발동되고 술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는 현주(玄酒·맑은 물, 밤중에 우물물을 뜰 때 검게 보이기 때문)를 올리기도 하고, 감주(甘酒)만 올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망자가 맥주만을 좋아했다고 맥주를 올리기도 그렇고, 와인이나 양주를 올리기도 그렇지 않은가.
예로부터 제사상에 술을 올리는 의미는 ‘강신(降神)’을 위한 것으로 죽음과 혼백이 둘이라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술은 천상과 지상의 영혼을 연결해주는 음식으로 믿었고, 제사에 꼭 필요한 음식으로 술이 꼽힌 것이다. 차례나 제사가 끝난 후 제사상에 올렸던 술을 마시는 것을 음복주(飮福酒)라고 하는 것도 모두 이런 연유에서다.
제물로 복숭아는 쓰지 않는다. 이는 복숭아나무를 귀신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돌아가신 조상들도 귀신 아닌가. 때문에 복숭아로 담근 술이나 붉은 색을 띤 술은 제주로 올려서는 안 된다. 집에서 담근 술을 제주로 올릴 경우 봉해진 용기에서 첫술을 올려야지 퍼마시던 용기의 술을 올리는 것은 예가 아니다.
제사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늘로 향하는 향 연기와 술밖에 없다. 정종이 아닌 소주라도 정성껏 술을 올리면 이 술이 곧 복이 돼 지상에 내리니, 제주가 곧 복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