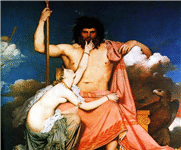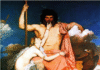알코올의 의존성, 내성 및 금단현상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행동도 바뀌어 외향적인 행동을 취할 때도 있다.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았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잠시 잃어버렸다는 좋은 기억 때문에 또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런데 신체에선 점진적으로 술에 대한 내성(tolerance)이 생겨, 점차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 종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개 대사성 내성과 기능성 내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간에서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CYP2E1 효소를 알코올이 더 유도시켜 술의 대사가 빨라져, 알코올의 혈중 농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또는 덜 취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들 내성 현상은 대개 동시에 일어나 더 많은 양의 술을 요구하게 된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뿐만 아니라 코카인 등의 마약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이런 현상을 중복 내성이라고 한다.
생체 내의 내성으로 인해 음주하는 술의 양을 점차 늘려가면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돼 버린다. 그래서 술이 몸에 나쁜지 알면서도 술을 다시 마신다. 만약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다가 갑자기 금주를 하면 반대로 금단현상이 일어난다. 대개 6~48시간 이내에 금단현상이 생기는데, 손발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며 제정신을 잃고 안절부절 못한다. 심한 경우 정신 혼돈과 착란이 일어난다. 이러한 금단현상으로 생기는 불쾌한 감정이나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술을 다시 마시는 것이다. 이런 금단현상도 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습관성 담배 흡연자나 마약 상습자들도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술과 마약에 대한 내성, 습관성 또는 금단현상은 왜 일어날까. 이는 사회적, 개인적 건강과 관련된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아직도 확립된 정설은 없지만 장기간 과음하면 술과 마약이 뇌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산의 조성을 바꾼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장기간 음주는 뇌세포의 필수 구성 성분인 인지질(燐脂質) 중 특수 불포화지방산인 docosahexanoic acid(DHA)의 함량 및 분포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그 결과 인지질의 조성이 변해 생체 세포막의 유동성(流動性)이 변한다.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세포막에서 신호 전달물질(signal transduction)에 관여하는 GTP/GDP 결합 단백질들의 조성과 기능이 바뀌어서 내성과 의존성이 일어난다고 한다. 한편, 갑자기 금주를 하면 이렇게 이미 바뀌었던 생체막의 인지질 조성과 GTP/GDP 결합 단백질의 조성이 금방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쾌한 금단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전과 마찬가지로 술뿐만 아니라 상습 흡연과 마약중독도 비슷한 금단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중독이나 금단현상도 비슷한 병리, 생화학적인 양상과 원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