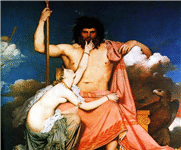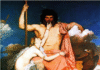꽃 피자 술 익고, 달 밝자 벗 왔네…
술을 소재로 한 옛 시조
이정보․박은 등은 술과 벗 시에 담아
조지훈 “술이 아닌 人情을 마시는 것”

인류에게 술은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교의 명약’으로 인정받아 왔다. ‘술이 떨어질 무렵 친구도 떨어진다’는 말은 이를 가장 절묘하게 표현한 러시아의 속담이다. 혼자서 술 마시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장면 중 하나다. 자고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술이란 여럿이 함께해야 맛과 멋이 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지 않다면 권주사(勸酒辭)가 필요 없다.
풍류와 멋을 알았던 선인들은 유독 친구와 술을 소재로 한 시조를 많이 남겼다. 조선 후기 때 문신 이정보(1693~1766)의 글은 주의(奏議․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에 능했다. 생각하는 일은 반복해 상소하고 사륙문(四六文․한문의 한 체)에 뛰어난 시조의 대가로서 《해동가요(海東歌謠)》에 시조 78수의 작품을 남겼다.
꽃 피자 술익고 달 밝자 벗이 왔네
이같이 좋은 때를 어이 그저 보낼소냐
하물며 사미구(四美具)하니 장야취(長夜醉)를 하리라
자연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변화 속에서 인간도 술을 생각하고, 벗을 생각하며, 완월장취(翫月長醉)를 꿈꾼다.
이 시조에서는 자연과의 합일(合一)에 의한 서정적 자아(自我)가 호방하면서도 향락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 자아의 합일은 ‘꽃 아래 벗을 데리고 달을 벗 삼아 오래도록 술에 취하겠다’는 지은이의 바람은 아닐까.
술과 친구라는 구조 속에서 벗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시를 지을 수 있는 벗이 제1, 이야기를 잘하고 청담(淸談)을 즐길 수 있는 벗이 제2,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벗이 제3,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벗이 제4, 주령(酒令)이 통하는 벗이 제5라고 한다.
이정보의 글은 꽃이 피고, 술이 익고, 달이 밝고, 벗이 찾아온 좋은 때를 그저 보낼 수 없어 밤새도록 취하리라는 시조다. 하물며 사미(四美), 즉 4가지 아름다움(四美具․꽃, 술, 달, 벗)이 모두 갖춰졌으니 시인이 아니더라도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미가 꽃과 술과 달과 벗뿐이겠는가. 때로는 ‘봄여름가을겨울’의 특색을 드러낸 아름다운 풍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서남북’의 진기한 특산물을 사미라 일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잔치의 풍류를 따지는 마당에선 사미를 곧 양신(良辰․좋은 시절), 미경(美景․아름다운 경치), 상심(賞心․완상하는 마음), 낙사(樂事․즐거운 일)라고 해서, 이 사미와 함께 현주(賢主)와 가빈(佳賓)이라는 이난(二難)을 아우르는 것을 지극한 풍류로 찬미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는 순서에 따라 우리는 또 4가지 감각을 곧잘 화제에 올리기도 한다.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이 바로 그것이다. 즉, 처음에는 빈 잔에 술 따르는 소리를 들으며 귀로 취하고, 다음엔 잔에 가득 담긴 술의 빛깔을 보며 눈으로 취하고, 그 다음엔 술잔에서 풍기는 향기에 코로 취하며, 마지막에야 비로소 그 잔을 비우며 혀끝에 감도는 맛에 취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 음주 사미에다 마신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느껴지는 짜릿한 촉감까지 더하기도 하니, 우리는 그것을 ‘음주 오미(五美)’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사미 또는 오미가 취흥(醉興)을 실은 술 노래에 자주 등장했을 것은 불문가지일 터인데, 다음은 그 중에서도 소리를 듣고 귀로 취한다는 노래다.
맹호연(孟浩然), 이태백(李太白), 도연명(陶淵明)은 모두 술에 일가견이 있었던 중국의 시인들이다. 특히, 도연명은 자신이 살던 집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이를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자칭했던 사람이다. 항상 머리에 칡으로 만든 갈건을 쓰고 다니다가 술이 익으면 문득 그 갈건을 벗어 술을 거르고는(葛巾漉酒) 다시 그것을 머리에 쓰고 다녔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물론, 이 노래에 나오는 도연명은 실존 인물 도연명이 아니라, 도연명처럼 은자(隱者)적 삶을 영위하는 작중 화자의 술벗이다. 그 벗을 찾아 마을 동구를 돌아드니 벌써 손님이 오는 줄 알고 갈건으로 술을 거르는 소리가 마치 가랑비 소리처럼 반갑게 들린다는 것이다. 이렇듯 4가지(또는 5가지)의 아름다움을 상정(觴政)하며 술 마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쾌한 취흥을 즐기자는 것이다. 그래서 “맹호연 타던 전나귀 등에 이태백 먹던 천일주 싣고/ 도연명 찾으려고 오류촌 돌아드니/ 갈건에 술 듣는 소리는 세우성인가 하노라”라는 시가 전해지고 있다.
다음의 시조는 박은(朴訔․1370~1422)의 작품이다. 술이 잘 익었다는 마누라의 언질에 혼자 먹기가 그래서 친구를 초대하는 시다.
오늘 아침 마누라가 넌지시 귀띔하길
도가지에 빚은 술이 이제 갓 익었다네!
무슨 흥 혼자 마시리. 자네 오길 기다리네.
이 글을 받은 친구는 한달음에 달려오지 않을 리가 없다. 술도 술이려니와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이기도 하다. 역시 술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과 마셔야 제맛이 날 것이다. 그러나 술이란 게 흥이 되기도 하고 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선인들은 술을 경계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연암도 유득공의 편지에 답하면서 술잔과 관련된 글을 보내기도 했다. 한 예로, ‘술잔 배(盃)’자는 ‘가득 채우지 말라’는 의미이고, ‘술난 치(巵)’자는 ‘위태할 위(危)’자와 비슷하다며 술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人情)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흥에 취하는 것이다”는 조지훈 시인의 술 예찬 ‘술은 인정이라’이다.
제 돈 써가면서 제 술 안 먹어 준다고 화내는 것이 술뿐이요, 아무리 과장하고 거짓말해도 밉지 않은 것은 술 마시는 자랑뿐이다. 인정으로 주고 인정으로 받는 거라 주고받는 사람이 인정에 함께 희생된다. 흥으로 얘기하고 흥으로 듣기 때문에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흥으로 인해 진위를 개의치 않는다.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흥에 취하는 것”이 “오도(吾道)의 자랑이거니와 그 많은 인정 속에 술로 해서 잊지 못하는 인정가화(人情佳話) 두 가지를 지니고 있다”고 조지훈은 읊고 있다.
몽테뉴처럼 산을 사랑한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산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서재를 만들고 가능한 시간을 산에서 보냈다. 그의 학문적 토대는 산을 오르내리며 구상했고, 산에서 고담준론(高談峻論)을 나눌 벗과 책, 좋은 술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품이라고 여겼다. 산에 오르는 것은 순례의 자세이자 수행의 자세다. 그래서 불교에선 만행(萬行)을 중요한 수행덕목으로 높이 평가한다. 걸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 나’를 만날 수 있으며, 내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성(詩聖) 두보는 고희(古稀)를 언급한 시 ‘곡강시(曲江時)’에서 “외상 술값이야 가는 곳 마다 있지만, 인생 칠십은 드물구나(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라고 했다. 술과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원호문(元好問․1190~1257)의 ‘매피당(邁陂塘)’ 중에 정(情)의 시 ‘안구사(雁丘詞)’가 있다. 정과 음주의 상관성 측면에서 읊어본 것이다. 술은 정의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마시는 것이다. ‘다만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신 흥취를 좋아하는 것’이다. 술이라는 것은 칠정(七情)에 솟구쳤을 때 마셔서는 안 되며, 화풀이 술을 비롯해 일체의 잠재 감정을 술로 풀거나 선동하는 것은 사도(邪道)로 알았다. 그런 시각으로 술을 인정이라고 볼 때 취흥을 터득한 인생의 너그러움과 멋, 그 무상(無償)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안구사(雁丘詞)/ 원호문(元好問)
問人間情是何物/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直敎生死相許/ 정이란 무엇이기에 생사를 가늠하게 하는가
天南地北雙飛客/ 하늘과 땅을 가로지르는 저 새들아
老翅幾回寒署/ 지친 날개 위로 추위와 더위를 몇 번이나 겪었던고
歡樂趣 離別苦/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고통 속에 헤매는
是中更有癡兒女/ 어리석은 여인이 있었네
君應有語/ 님께서 말이나 하련만
渺萬里層雲/ 아득한 만리에 구름만 첩첩이 보이고
千山幕景/ 해가 지고 온 산에 눈 내리면
隻影爲誰去/ 외로운 그림자 누굴 찾아 날아갈꼬
橫汾路/ 분수(汾水) 물가를 가로 날아도
寂寞當年蕭鼓/ 그때 피리와 북소리 적막하고
荒煙依舊平楚 / 자욱한 안개만 아스라이 펼쳐있네
招魂楚些何磋及/ 초혼가를 불러본들 어찌 살아오시리까
山鬼自啼風雨/ 산바람만 빗속에 흐느끼며 우는데
天也如 未信與/ 하늘도 질투하는지 더불어 믿지 못할 것을
鶯兒燕子俱黃土/ 어찌 잡새처럼 죽은 몸 흙바닥에 버리리요
千秋萬古 爲留待騷人/ 천추만고에 어느 시인을 기다려 머물렀다가
狂歌痛飮/ 취하도록 술 마시고 미친 노래 부르며
來訪雁丘處/ 기러기 무덤이나 찾아올 것을
김용의 무협소설 《신조협려(神雕俠侶)》 중 이 안구사(雁丘詞)를 적련선자(赤練仙子) 이막수(李莫愁)가 처음 등장하면서 부른 노래다. 그리고 절정곡(絶情谷)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어가면서도 이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는 기러기의 죽음을 그린 것이지만, 실은 기러기 이야기를 빌어 젊은 남녀의 생사를 초월한 진실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전반부는 짝잃은 기러기의 순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생사를 같이 취하도록 술 마시고 미친 노래가 온 누리를 적시게 한다. 정 그리고 취함이다. 할 수밖에 없음을, 후반부는 기러기를 묻어주는 작가의 감개를 그리고 있다.
《김용서화(金庸書話)》라는 책을 보면, 정시하물(情是何物)이란 물음은 100년, 1000년도 더 된 것이며, 아무도 ‘정(情)’이 무엇인지 답을 내지 못했고, 이제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고인들의 시구(詩句)를 빌어 정을 6단계로 그리고 있으며, 그중 마지막이 ‘직교생사상허(直敎生死相許)’의 단계라고 쓰고 있다. 정과 술은 불가분의 관계의 설정에서 그리는 것이다.
1단계:오늘 달을 보다보니 문득 창밖의 매화가 예전과 다름을 느끼네(一樣同是窓前月, 才有梅花便不同). 정을 품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경개다.
2단계:나는 청산이 매우 사랑스럽네. 청산아! 너도 내가 그러하냐(我見靑山多姸媚). 서로의 정이 진실하다고 믿기 시작하는 경개다.
3단계:공산(空山)에 사람은 안 보이건만, 사람소리 메아리로 들려오네(空山不見人, 但聞人語響). 정인의 웃는 모습과 목소리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경개다.
4단계 : 구해도 얻지 못하니 오매불망, 전전반측하네(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愈哉, 轉戰反側). 사랑이 이뤄지지 못하자 한을 품게 되는 경개다.
5단계: 그리운 정 씻으려 해도 씻지 못하네, 가까스로 찡그린 이마 펴려하나 수심 먼저 가슴 속에 서리는 것을(此情無計可消除, 才下眉頭, 却上心頭). 임은 떠나고, 아무리 해도 정념을 떨칠 수 없는 경개다.
6단계:생사를 함께 하게 하네(直敎生死相許). 이별의 고통과 상사의 괴로움을 죽음으로 풀어버리는 경개다.
이 6단계로는 정이 무엇인지 답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생사를 함께 하게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정’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러니 정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생사를 함께 하는 것’
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상의 음식 ‘술’, 하지만 주역(周易) 연구가인 초운 김승호 선생의 말에 의하면, 술을 마시면 머릿속의 신(생각)이 일으켜지는데 그것이 정(감정)으로 발한다. 헌데 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을 터뜨리지 않아야 몸에 좋다. 술이란 천상의 음식으로 신선들만 마시던 것인데,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신의 형상을 빌어 만들어진 사람을 귀히 여겨 하늘에서 술을 내렸고, 곧 인간들도 마시게 된 것이다. 즉, 술이란 곧 하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마다 술이요 단계마다 술이다.
*이상의 자료는 중앙대 남태우 교수(문학박사)의 〈홀수배 飮酒法의 의식과 허식〉에서 발췌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