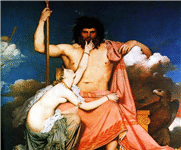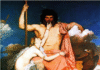음주의 변
권 영 재
 술은 음식이다. 모든 모임에는 음식과 함께 술이 있어야 분위기가 무르익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장에는 의례 술이 있게 마련이다.
술은 음식이다. 모든 모임에는 음식과 함께 술이 있어야 분위기가 무르익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장에는 의례 술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몇 해 전만해도 술이라곤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했다. 아버지의 엄격한 훈계 탓도 있었지만 사실 여자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격에 맞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스스로 금주파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도 성가해서 떠났고 남편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별로 구속을 하지 않으니 퍽 자유로워 져서 술을 입에 대게 되었다. 특히 문학모임이 잦다보니 문우들에 이끌려 한 두 모금 입에 댄 것이 지금은 막걸리나 맥주 정도는 한 두 잔쯤은 부담 없이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가끔 놀림도 받는다. 술 대장 이라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스승님의 조크에 그만 웃음이 폭발 할 때도 있다.
그래도 나는 즐겁다.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한이 되겠지만 조금씩 적당히만 마시면 혈액순환을 증진 시켜주는 약주가 된단다. 연회석이나 결혼식 피로연 석에도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바로 술이다. 나는 <예이츠의 술 노래>를 좋아한다. ‘술은 입으로 사랑은 눈으로 우리도 한 세상 즐겁게 살자꾸나’ 나는 이 시를 여고 때부터 즐겨 암송했다. 짤막한 이 시를 가끔씩 콧노래로 흥얼거릴 때도 술에 대한 낭만이 내게 있었다는 걸 요즘엔 실감하고 있다.
모두들 한잔씩 하는 자리에서 술을 못한다고 술잔을 거부 하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미안스럽다. 그렇다고 권하는 대로 쉴 새 없이 받아 마시는 여성도 좋은 매너라고 할 수는 없겠다.
어느 정치인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아주 융숭한 식사대접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런데 자칭 책임자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더니 분별없이 술을 들이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분은 일을 위해 술을 마시는지, 술을 마시기 위해 일을 만드는 것인지를 분간 할 수 없을 정도의 호주가(好酒家)로 느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답지 못한 음주태도라 여겨졌다. 매우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술은 제사상에도 오른다. 지방(紙搒)을 향해 이배(二拜)의 절을 올린 다음 제관들의 서열에 따라 술잔을 드린다. 향불이 피어 오르는 향로 위를 세 번 돌리고 드리는 의식은 자못 경건 하다. 제사가 끝나면 온 제관들이 둘러 앉아 조상들의 유덕을 기리며 음복 한다. 이때 여성들은 음복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일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여성이 제사에 참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스님이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회식을 하는 자리에 술과 고기 등 맛있는 요리가 푸짐하게 나왔다. 스님은 술은 물론이고 고기까지도 맛있게 잘 먹었단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께서 ‘중도 술과 고기를 먹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스님은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중이 먹는게 아니고 사람이 먹습니다.’라고 응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익살로 지어낸 우스겟 소리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모든 음식은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리지 않고 골고루 영양섭취를 해야 한다는 뜻일 게고, 또 하나는 종교적 금기는 수천년 전에 정해놓은 율기(律紀)이니 이제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변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주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여성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 왔던 아랍문화권에서도 이제는 얼굴을 가리는 <차돌르>를 벗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여성들의 음주 가무정도는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야 하리라 생각해 본다. 너무 과하게만 마시지 않는다면 술은 피부 미용과 혈액순환에도 좋다는 의학계의 주장을 나의 음주변(飮酒辯)으로 내 놓는다.